| 기간 | 7월 |
|---|
[에세이] 내 인생의 퀴어영화 #2
: 해피 투게더
|
* 수만 개의 삶과 사랑, 아픔과 감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매력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즐겨봅니다. 특히 영화에서 그려지는 주인공들의 삶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느낌은 배가 되죠. 영화로 만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 이번 에세이에는 영화 <해피 투게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사랑이 무언지 모르던 시절에도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쥐가 난 것처럼 아팠던 적이 있었다. 나이가 웬만큼 차고 나서 그게 사랑이란 걸 알았지만 그땐 나도 이미 소년은 아니었고 어쭙잖게 닳은 사랑의 요령을 지니게 되었다. 사랑이란 과거를 약속하거나 희망하지 않는다. 늘 미래를 꿈꿀 뿐이다. 오늘 속 사랑이 어제가 되는 순간 추억이라는 의미로 바뀌듯 사랑이란 항상 현재에서 미래로 치닫는 현재진행형일 때 가장 아름답고 달콤하다. 결말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현재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 같은 사랑에는 정답이란 게 없다. 담긴 그릇마다 제 각각이란 소리다. 누가 누굴 가르쳐 줄 수도 전수해 줄 수도 없는 오롯이 스스로 겪어 깨달아야 하는 게 사랑일 거다. 나 또한 무던히도 그랬으니까.
사랑이 무언지 모르던 시절에도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쥐가 난 것처럼 아팠던 적이 있었다. 나이가 웬만큼 차고 나서 그게 사랑이란 걸 알았지만 그땐 나도 이미 소년은 아니었고 어쭙잖게 닳은 사랑의 요령을 지니게 되었다. 사랑이란 과거를 약속하거나 희망하지 않는다. 늘 미래를 꿈꿀 뿐이다. 오늘 속 사랑이 어제가 되는 순간 추억이라는 의미로 바뀌듯 사랑이란 항상 현재에서 미래로 치닫는 현재진행형일 때 가장 아름답고 달콤하다. 결말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현재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 같은 사랑에는 정답이란 게 없다. 담긴 그릇마다 제 각각이란 소리다. 누가 누굴 가르쳐 줄 수도 전수해 줄 수도 없는 오롯이 스스로 겪어 깨달아야 하는 게 사랑일 거다. 나 또한 무던히도 그랬으니까.
왕가위 감독의 <해피 투게더>를 육년 만에 다시 꺼내보았다. 2009년에 와서야 국내 재개봉 시 본 나로서는 이번이 육년 만에 재관람인 셈이다. 그때보다 덜 안타깝고 덜 사무치는 이유는 육년 동안 내가 더 사랑이란 감정에 속물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때는 보영의 무책임한 행동들에도 이해와 의미를 두었었는데 지금은 그저 “저 화상 애물단지가 뭐가 그리 좋다고”라며 아휘가 불쌍해 보이기만 하다. 마치 보영에게 아휘는 인큐베이터 같고 아휘에게 보영은 도요새 같다.
왕가위 감독, 장국영, 양조위, 장첸 주연의 이 영화는 보영(장국영 분)과 아휘(양조위 분)가 아르헨티나에서 나누는 사랑과 애증을 보여준다. 이기적인 보영의 성격 탓에 아휘는 몇 차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게 되고 보영에 지친 아휘에게 대만 청년 창(장첸 분)이 다가와 위로를 건넨다. 창은 우수아이아로 떠나고 보영은 아휘의 흔적으로 다시 찾아들지만 아휘는 대만으로 떠나고 없다. 그들은 그렇게 같이 있어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워한다. (여담으로 장국영의 콘서트 일정 때문에 아휘와 창의 이야기가 급조되어 촬영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그의 손이 낫지 않기를 바랬다. 아픈 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아휘에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를 반복하며 떠났다 돌아오는 되돌이표 보영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정확히 기억나는 흉터의 기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둘이 함께 가자고 약속하던 이구아수 폭포는 아휘와 보영의 사랑이 꿈꾸는 이상향의 그 무엇 같지만 서로에 대한 애증일지도 모른다. 그래 사랑이란 그 지긋지긋한 녀석......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고 나는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여전히 한다. 
사랑이 삶을 이길 수 없는 게 엄연한 대부분의 현실이지만 사랑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할 테니 그 앞에 버틸 도리가 없지 않은가. 사랑 때문에 산다고 착각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아!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는구나. 때론 숭고하기도 하여라. 아휘와 보영은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만남을 반복하며 그들만의 선혈 같은 사랑을 하고 애끓으며 아파한다. 보영의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찾아가 유랑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아휘는 자신과의 시간이 지겨워졌다며 다시 떨치고 떠나버리는 보영이 밉지만 오히려 자신을 원망한다. 그런 보영을 지워내지 못하는 자신이 불쑥 불쑥 튀어 올라 스스로를 괴롭히니 더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다.
그렇듯 둘의 끈덕진 인연을 보여주는 작은 소품이 있다. 아휘와 보영이 각자 한쪽 귀에 달고 있는 귀걸이. 둘의 인연 끝자락을 묶어둔 매듭일까? 아니면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남겨 두고픈 흔적일까? 그래서 이 영화는 외줄타기처럼 위태로운 연인의 이야기이면서도 아주 오래된 측은지심이 깊이 깔린 애증 이야기이기도 하다.
 “春光乍洩(춘광사설)”. 무어라 뜻풀이를 해야 할까. <해피 투게더>의 한자식 영화명이다. 갑자기 쏟아지는 봄빛? 겨울을 지낸 봄빛은 따사롭고 새 기운을 느끼게 해주지만 이 영화의 이야기 어디서도 그런 봄빛의 희망을 또렷이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거듭 칙칙하고 암울하고 쓸쓸하다. 단지 창이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등대 아래에서 아휘의 슬픔을 땅 끝에 대신 묻어주는 것이, 또 아휘가 대만 랴오닝 야시장에 있는 창의 부모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먹은 후 창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오며 되뇐 말이 그나마 그들을 새봄으로 넘겨줄 작은 책갈피가 아닐까.
“春光乍洩(춘광사설)”. 무어라 뜻풀이를 해야 할까. <해피 투게더>의 한자식 영화명이다. 갑자기 쏟아지는 봄빛? 겨울을 지낸 봄빛은 따사롭고 새 기운을 느끼게 해주지만 이 영화의 이야기 어디서도 그런 봄빛의 희망을 또렷이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거듭 칙칙하고 암울하고 쓸쓸하다. 단지 창이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등대 아래에서 아휘의 슬픔을 땅 끝에 대신 묻어주는 것이, 또 아휘가 대만 랴오닝 야시장에 있는 창의 부모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먹은 후 창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오며 되뇐 말이 그나마 그들을 새봄으로 넘겨줄 작은 책갈피가 아닐까.
영화에서 보영은 상당한 이기주의자이며 바람둥이에 생양아치다운 게이이다. 반면 아휘는 보영과 지순한 사랑을 바라고 열심히 일을 하며 노력하지만 보영의 이기주의적 편력에 점점 지쳐간다. 이런 변화의 시점들이 흑백과 컬러의 배치로 무대에서 막을 가르듯 영화의 흐름을 분할한다. 과거와 현재 같은 시간적 관계 또는 보영과 아휘의 감정적 상황으로 나눈 인간적 관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해낸다. 또 하나 <해피 투게더>의 백미는 촬영감독인 크리스토퍼 도일의 감각적 능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내 개인적 사견으로 왕가위 감독의 연출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건 크리스토퍼 도일 감독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두 명장의 호흡은 곳곳에서 한껏 뿜어져 나오고 있다.

마치 데자뷰 같은 형식의 컷이라든가 외부와 내부를 원 테이크처럼 보이도록 연결하거나 누군가가 숨어서 인물들을 관찰하는 듯 하는 앵글과 각도 그 속에서 훌륭히 제 역할을 다해내는 사물과 구조물들이 엮어내는 크리스토퍼 도일의 구도 미학은 가히 일품이다. 아! 그러고 보니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게 된 것도 육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나의 관람 형태인 것 같다. 이게 지금 나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숙제를 하듯 영화를 보게 되므로......

왜? 어째서 이 인물은 이렇게 형성되었는가를 굳이 조목조목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특히 보영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가 왜 그토록 에고이스트 조울증 약쟁이 같은 캐릭터가 되었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인물이 크게 거슬리거나 겉돌거나 불편하지 않다. 故 장국영의 연기력이 빛을 발해서일까.
보영이 말한다. “나랑 지낸 시간을 후회해?” 아휘가 대답한다. “그걸 말이라고 해? 네 얼굴 보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후회돼 미치겠어.”
보영으로 인해 또 다시 상처 받을게 분명하지만 보영에게 향하는 그리움을 떨쳐낼 수 없는 아휘가 술에 취해 보영이 있는 호텔을 찾아가 나누는 대화다. 이 짧은 대사만으로도 두 인물의 사랑 속에 어떠한 감성들이 침전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또 헤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자신에게 괴로워 오열한다. 함께 가자고 했던 이구아수 폭포엔 아휘 홀로 서있다. 세찬 물보라로 눈물을 가린 채로...... 어디 있는지 알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대만으로 간 아휘의 말이 엽서처럼 남겨지고 타이페이 밤거리 위로 더 터틀스의 'Happy Together'가 대니 청의 목소리로 흐르며 왕가위 감독의 영화 <해피 투게더>는 잊지 못할 여운과 묘하도록 허한 여백을 남겨준다. 아휘의 되뇜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며 나의 두서없는 글을 갈무리하려 한다.
“그가 아플 때가 가장 행복했으니까”
“그와 함께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은 너무 오래되어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습관인가 보다.
![]()
이쪽사람들 조합원, 친구사이 회원 / 강우
* 소식지에 관한 의견이나 글에 관한 피드백, 기타 문의 사항 등은 7942newsletter@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소식지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게시판에서 신청해주세요. ☞ 신청게시판 바로가기
*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친구사이의 활동을 후원해주세요. ![]() 후원참여 바로가기
후원참여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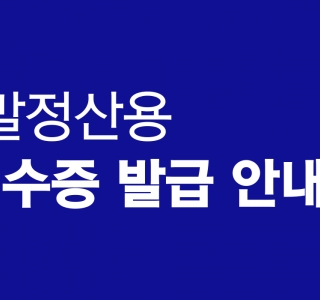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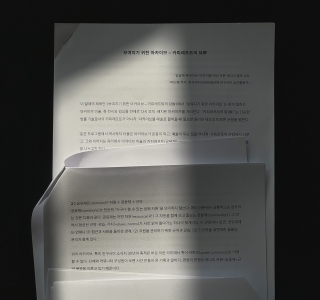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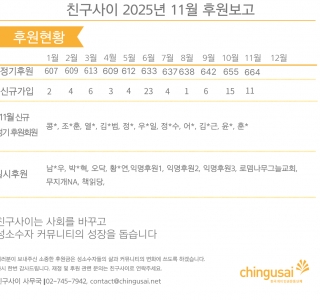










연륜이 느껴지는 감상평이네요
저도 몇 년 전 KU시네마트랩에서 다시 봤었는데
영화의 내용과 더불어 부감으로 찍은 이구아수 폭포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