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5월 |
|---|
[게이클럽 탐방기] 데뷔10년차, 클럽처녀, 그리고 일반 여자의 PULSE
우리 이태원 갈까?
샌더 (데뷔10년차)
종로의 어느 주말. 술에 취해 한껏 흥이 올라, '이태원에 가자'고 했더니 덥석 그래 가자. 하는 친구들과 택시에 올랐다. 택시에서 내려 누군가 딱히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길을 건너 편의점에 들러 돈을 뽑고. 펄스 입구에 줄을 지어 선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술자리에서 '지금 이태원 갈까?'는 곧, '펄스에 갈까?'인 것이다.
물론 이태원에 펄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펄스에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게 주말 밤의 이태원 나들이는 펄스에서 끝이 난다.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딱히 불만스럽지도 않은 정도의 선곡. 간혹 발에 채이는 술병.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는 전화번호를 묻고야마는 친구들. 몇몇 눈에 띄는 훌륭한 외모의 게이들. 더워진 마음에 몸을 맞대고 헐떡거리며 춤을 추는 일과 한 때 같이 놀았던 사람을 발견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일.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기운을 불어 넣는다.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의 경계가 없이 그저 모두가 엉킨 채로 주고받는 요상한 기운말이다.
누군가와 단순히 끈적한 춤을 나눌 수도 있고, 마음이 맞으면 모텔에 갈 수도 있겠지.
이태원에 가자는 말이 펄스에 가자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다고 해서 펄스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단지 우리에게는 그나마 나은 공간이 펄스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든 내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어쨌거나 펄스라고 이름 지어진 이 장소에 내가 묻은 추억들도 언젠가는 펄스와 함께 없어질지 모른다. 흥하고 망해간 수많은 이곳의 클럽들이 그랬던 것처럼, 펄스가 없어지면 그 자리를 대신할 공간이 생기리라는 것도 잘 안다. 클럽의 권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우리들은 별로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늘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곳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곳으로 몰려가면 그 뿐이다. 슬프게도 시간이 지나면 펄스에 묻어둔 지나간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고, 더 황홀한 순간을 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기꺼이 그곳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다.
이태원에 가자는 말에서도 펄스는 사라지고, 어쩌면 이태원조차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그런 모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밤을 꼬박 새우고 땀으로 범벅된 채 클럽을 나설 때에는 늘 설명하기 애매한 심적 개운함 같은 것이 느껴진다.
밤을 가득 메웠던 그 수많은 기운들이 흔적도 없다.
I left my head and my heart on the dance floor
mika (클럽처녀)
처음 펄스에 발을 들여놓은 건 작년 가을쯤임. 종로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태원 클럽에 가자 했고, 그렇게 이끌려 간 곳은 펄스. 그전까진 클럽뿐 아니라 이태원도 밤엔 나와본 적이 없었음. 클럽은 커녕 술집이나 바나, 심지어 노래방도 쿵쾅거리는 소음과 그 알 수 없는 음탕함에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나름 순진했던 시기였음.
그렇게 이태원에 도착해 펄스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치 흰 토끼에 이끌려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토끼굴을 내려가는 것 같음. 계단까지 이미 사람으로 가득 차 천천히 내려가면서 열심히 두리번 두리번. 오- 여기가 게이클럽이란 데군…… 처음와서인지 펄스 분위기도 그렇고, 게이가 그렇게 많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도 신기함. 그렇게 끝을 알 수 없는 굴 바닥에 떨어졌을 땐 뭔가 내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곳이었음. 메케한 담배연기와 어지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서있기 조차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 차있었음.
어색한 시간도 잠시, gaga, ke$ha, rihanna, b.e.p. 등등 익은 비트가 고막을 내리침. bad romance가 나올 때 갑자기 플로어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데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같았음. 근데 1년이나 지난 bad romance라니… so 2009. 선곡은 좀 후지네.
처음 간 클럽이어서 그런지 술도 많이 마셨고, 반은 정신병 같고, 반은 최면상태 같은 상태에서 흔들어대면서 주머니 속 열쇠와 핸드폰은 열심히 찾아댔음.
클럽이 좋았던 점은 내가 그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군중 속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임. 압박감도 잠시 내려놓고 정신줄도 내려 놓음. 밤이 다가게 춤을 추고 클럽을 나오면서 연간회원권이라도 끊고 싶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 클럽 이름이 뭐라고?”
이 많은 남자들이 게이라고?
지나 (탐험 간 일반녀)
믿거나 말거나, 나름 화류계 일진 출신인 상근로봇. 일진 시절 이태원은 그닥 활성화되지 않아서 겪어볼 일이 없었더랬다. 모종의 사고를 친 이후 10년을 꼬박 경건한 청교도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친구사이 게이들의 음모에 빠져 그간의 수행을 뒤로 하고 10년 만에 처음 가게 된 곳이 바로 게이클럽 펄스.
소문은 익히 들었으나, 토요일 새벽3시에 가게 된 펄스에 들어가며 3번을 크게 놀랐다. 처음엔 여자는 입장료가 2배라는 것. ‘아니 내가 무슨 해코지를 한다고 2배를 내야해? 나만큼 친게이적인 년 있음 나와보라고 해!’라고 항의도 못하고 (흑!) 곱게 2배의 입장료를 내고 입장. 입장해서 클럽 안의 광경을 보는 순간 두 번째 놀라움. ‘와! 이 사람들이 다 현금 내고 들어왔어! 나 로또 맞으면 게이클럽 차릴래!’에 이어 세 번째 놀라움. ‘와! 게이가 이렇게 많아!’ 그렇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 게다가 어찌나 다들 훈훈하던지. 일반 여자들 사이에서 진리로 통용되는 ‘괜찮은 남자는 신부님 아니면 게이’임을 재삼 확인하며 ‘이런 남자들이 게이니까 내가 아직 솔로인 거야’ 하는 위안도 살짝 했더랬다.
노는 동안은 내심 눈치가 보인 것도 사실이다. 남의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기분이랄까?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을 로봇이 한 자리 뺏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말은 이렇게 해도 결국 새벽6시가 넘어서야 클럽을 나와 집으로 향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다. 수많은 게이들을 봤지만 그들은 극히 일부. 조용히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성소수자는 얼마나 많은 걸까? 하는 생각. 그들이 좀 더 많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겠단 생각을 했다. 더불어 매우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지만 앞으로는 온전한 그들의 놀이터로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출입을 자제해야겠단 생각도 들었...지만 과연 안 갈 수 있을까?
[172호][활동스케치 #4] SeMA 옴니버스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관람기 (1) : ‘친구사이’를 보는 친구사이, ‘지보이스’를 보는 지보이스
2024-11-04 19:08
기간 :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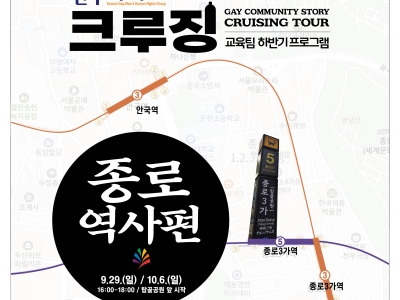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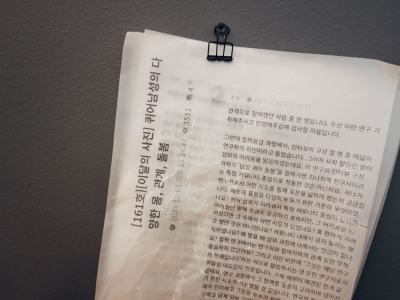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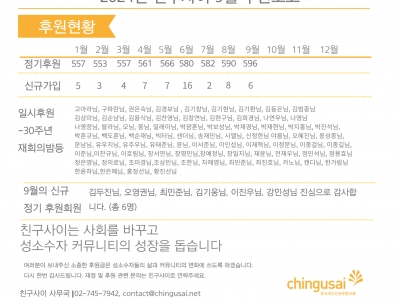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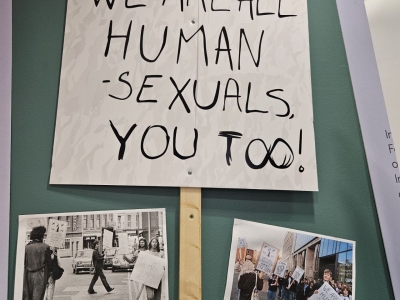

이밀
내년 공연도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