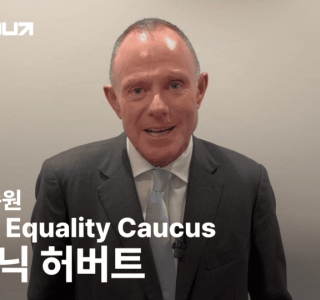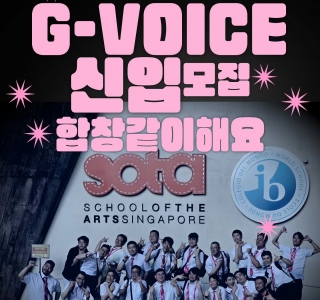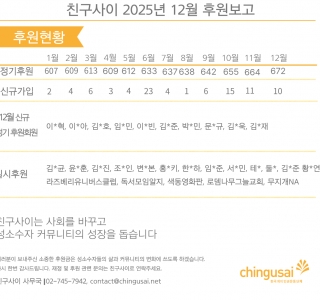소식지 연도별 기사
나무도 에이즈에 걸린다?
2008-09-05 오전 00:45:22
6585
2006년 10월
나무도 에이즈에 걸린다? / 가람
아이들은 기발하게도 그에게 '독사'와 같은 평범한 이름 대신 '에이즈'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그는 악독하고 가차없는 선생님이었다. 그에게 한 번 걸리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했다. 그래서 '에이즈'였다. '한 번 걸리면 죽는다'고. 내 고등학교 시절 가장 사납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었다.
어떤 대상에 다른 것의 이름으로 별명을 붙일 때에는 어떤 유사성에 기대기 마련이다. 앞의 선생님이나 '에이즈'나 '한 번 걸리면 죽는다'는 내용을 공유한다.(사실 에이즈가 그렇지는 않다.) 이런 은유의 관계는 때로 역전되기도 한다. 그 선생님을 '에이즈'로 부른 것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공포 역시도 강화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 유사성 자체가 잘못된 인식일 때이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을 "이런 매미 같은 녀석!"이라고 부를 때, 사실 매미는 억울할 만하다. 수 년간 땅속에서 지내다가 며칠을 번식을 위해 몸 속의 동공을 필사적으로 울리는 매미에게 노래만 불러대는 게으른 녀석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이니까. 그래도 매미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테니 덜하다. 인간 사이의 관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나 그 잘못된 인식이 치명적인 낙인이 될 때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에이즈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로 그렇다.
소나무, 참나무, 아까시나무도 '에이즈'에 걸린다. 소나무 제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아까시나무 황화 현상 등을 정부와 언론들은 너무나 손쉽게 각각 '소나무 에이즈', '참나무 에이즈', '아까시 에이즈'라고 부른다.["소나무재선충병은 현재까지 완전 방제약이 없고 피해 속도와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소나무 에이즈라 불린다"(<소나무제선충병, 아시나요?> 국정브리핑 2006년 5월 22일), "'참나무 에이즈' 시들음병 급속 확산"(SBS 뉴스, 2006년 8월 28일) 등.]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대책이 시급한 것임을 일깨우기 위해 선정적인 이름을 붙인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몇 가지이다. 한 번 걸리면 죽는다는 점,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 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 완치를 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되지 않은 점 등.
그러나 그 이유들은 전혀 맞지도 않다. HIV에 감염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곧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 제선충이 쉽게 스스로 옮겨가듯 HIV가 전파되는 것도 아니며, 인간 종을 절멸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에이즈/HIV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잘못된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 에이즈가 인간을 절멸시키는 질병인 것처럼 다시 각인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HIV 감염인은, HIV와 제선충이 전파 경로 양상이 전혀 다른데도, 제선충이 침입한 소나무처럼 격리되고, 이동이 제한되며, 사라져야 하는 위험한 존재와 같이 되어 버린다. 이럴 때 HIV 감염인의 인권이 설 자리는 없다.
무심코 쓰는 말에도 인권이 닿아 있다. 그것이 말을 가려 써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나 언어가 강력한 수단인 언론이나 정부는 더욱 가려 써야 한다. 에이즈는 질병일 뿐이다. 수전 손택의 말처럼 질병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데 다른 이미지를 덧씌워 더욱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말 좀, 잘 하자.
나무도 에이즈에 걸린다? / 가람
아이들은 기발하게도 그에게 '독사'와 같은 평범한 이름 대신 '에이즈'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그는 악독하고 가차없는 선생님이었다. 그에게 한 번 걸리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했다. 그래서 '에이즈'였다. '한 번 걸리면 죽는다'고. 내 고등학교 시절 가장 사납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었다.
어떤 대상에 다른 것의 이름으로 별명을 붙일 때에는 어떤 유사성에 기대기 마련이다. 앞의 선생님이나 '에이즈'나 '한 번 걸리면 죽는다'는 내용을 공유한다.(사실 에이즈가 그렇지는 않다.) 이런 은유의 관계는 때로 역전되기도 한다. 그 선생님을 '에이즈'로 부른 것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공포 역시도 강화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 유사성 자체가 잘못된 인식일 때이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을 "이런 매미 같은 녀석!"이라고 부를 때, 사실 매미는 억울할 만하다. 수 년간 땅속에서 지내다가 며칠을 번식을 위해 몸 속의 동공을 필사적으로 울리는 매미에게 노래만 불러대는 게으른 녀석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이니까. 그래도 매미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테니 덜하다. 인간 사이의 관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나 그 잘못된 인식이 치명적인 낙인이 될 때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에이즈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로 그렇다.
소나무, 참나무, 아까시나무도 '에이즈'에 걸린다. 소나무 제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아까시나무 황화 현상 등을 정부와 언론들은 너무나 손쉽게 각각 '소나무 에이즈', '참나무 에이즈', '아까시 에이즈'라고 부른다.["소나무재선충병은 현재까지 완전 방제약이 없고 피해 속도와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소나무 에이즈라 불린다"(<소나무제선충병, 아시나요?> 국정브리핑 2006년 5월 22일), "'참나무 에이즈' 시들음병 급속 확산"(SBS 뉴스, 2006년 8월 28일) 등.]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대책이 시급한 것임을 일깨우기 위해 선정적인 이름을 붙인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몇 가지이다. 한 번 걸리면 죽는다는 점,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 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 완치를 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되지 않은 점 등.
그러나 그 이유들은 전혀 맞지도 않다. HIV에 감염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곧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 제선충이 쉽게 스스로 옮겨가듯 HIV가 전파되는 것도 아니며, 인간 종을 절멸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에이즈/HIV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잘못된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 에이즈가 인간을 절멸시키는 질병인 것처럼 다시 각인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HIV 감염인은, HIV와 제선충이 전파 경로 양상이 전혀 다른데도, 제선충이 침입한 소나무처럼 격리되고, 이동이 제한되며, 사라져야 하는 위험한 존재와 같이 되어 버린다. 이럴 때 HIV 감염인의 인권이 설 자리는 없다.
무심코 쓰는 말에도 인권이 닿아 있다. 그것이 말을 가려 써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나 언어가 강력한 수단인 언론이나 정부는 더욱 가려 써야 한다. 에이즈는 질병일 뿐이다. 수전 손택의 말처럼 질병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데 다른 이미지를 덧씌워 더욱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말 좀, 잘 하자.
검색
[187호][활동스케치 #4] 2026년 1월 주한외교계 LGBT+ Coordination Group 참여 후기: 연대를 마주한 자리에서
기간 : 1월
2026-02-06 01:17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