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4월 |
|---|
[칼럼]
딱, 1인분만 하고 싶어 #1
: 커밍아웃의 무게
“오빠는 뭐 그렇게 당당하다고 다 드러내놓고 살아?
부끄러운 줄 알아.
세상 사람들 다 하나둘씩 비밀은 있어.
적어도 가족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고 살아야지.”
2022년 4월의 어느 날, 내가 마주한 질문이었다.

<만 31살, 신실한 기독교 소매업 장사꾼 가족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충남의 조그만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과 함께 서울의 동작이라는 지역에서 7년 간 살았으며, 또 대학원 진학과 함께 서울의 동대문이라는 지역에서 6년을 지낸.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에는 더 이상 내가 게이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공학 박사과정 졸업을 앞둬 이후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시스젠더 게이.>
[딱, 1인분만 하고 싶어] 라는 글을 통해 중언부언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난 한국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맥락없는 고민들이다.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저 단편적인 단어들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만, 그래도 간단한 정보 값을 드리는게 뭉툭한 나의 생각들을 갑작스럽게 마주할 누군가에겐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고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설명이 잘되진 않는다. 무언가를 크게 탓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질문이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 나름의 대답, 혹은 질문을 다시 찾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커밍아웃. 사전적 의미로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는 일.” 각자마다 세상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참, “그냥, 내가 당당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20대 중반부터 저지르기 시작했던 커밍아웃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가끔씩 하루하루 숨이 막히는 때가 있더라고.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당당하기 위해,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 과하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마주할 때가 있다. 분명 내가 여러 매체에서 마주했던 커밍아웃한 사람들의 모습은 한없이 밝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무겁기만 할까.

“하, 차라리 사람들이 다 잊었으면 좋겠다.”
야속하게도, 커밍아웃 이후의 삶이 흘러갈 때, 그것이 어떻게 무거워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었다. 그렇기에 더 쉽게 커밍아웃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지금도 겉보기에는 현실물정 모르고 겁도 없다는 말을 들으며 해맑게 살아갈 수 있는거겠지? [ 한국, 지방 소도시 출신 서울 거주자, 장남, 기독교, 공대 박사과정생 ] 이라는 키워드가 일상을 관통할 때, 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자원의 크기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애초에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다.
어떻게 보면, 이번 소식지 글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무게를 덜어내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소 이기적일지도 모르겠지만,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 결국, 그 총량은 커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번 칼럼은 크게 가족, 일, 서울 그리고 연애라는 네 가지 주제 속에서 각 주제별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함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1인분의 크기란 무엇인지 세-네 개 정도의 짧은 토막글들로 정리해볼 생각이다. 개략적인 프롤로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에서의 1인분
모든 관계라는게 그 상태 그대로 멈춰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0대 어느 날, 가족 모두가 커밍아웃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만큼은 흔히 미국산 성소수자 영화에서나 봐왔던, 상상할 수 있는 딱 그 모습이었다. 문제는, 우리 모두 늙어간다는 것에 있었지. 동생들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되고, 영원히 오빠 혹은 형으로만 존재할 것만 같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큰아빠, 혹은 형님(혹은 처남)이 되면서 가족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날의 환상은 와장창 깨져버렸다. 나야, 내가 게이니까 스스로 감내하고 살면 그 뿐이지만, 동생들은 내 가족이 게이인거니까. 그것도 오픈리 게이.
둘째, 일에서의 1인분
나름 연구비라는 형태의 소득으로 나의 일상을 책임지며, 10시 출근 10시 퇴근의 삶을 보낸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무래도 내가 일하고 있는, 특히나 교수-제자, 박사-석사라는 직급의 위계가 존재하는 직장에서의 커밍아웃이라는 것이 가끔씩 나를 짓누르는 순간들이 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쟤는 게이니까” 혹은 “게이는 원래 다 저래?”라고 상대방이 쉽게 판단해버릴 것 같기에 찾아오는 "더 잘해야한다는 압박감"이랄까. 연구라는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 나름의 윤리를 얼마나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당연하지만 있다. 오픈리 게이로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무 혹은 책임을 다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 나도 내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니, 내 사적인 건 배제하고 그냥 연구는 일로만 해야할까.
셋째, 서울에서의 1인분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도, 클럽을 좋아하는 것도, 종태원에서의 주말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계속해서 서울을 고집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생활비의 대부분을 대학원에서 받는 연구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서울의 집 한칸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 도시라는 시공간이 처음 만들어진게 결국 서로 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난 대체 이 서울에서 무엇을 맡기고 살아가는 걸까? 대도시의 1인 가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많은 1인 가구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서로에게 대체 무엇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걸까?

넷째, 연애에서의 1인분
“스스로 당당한 모습이 좋다.”,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나와 연애를 하고, 또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커밍아웃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대가 서서히 빛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곧 찾아온다. 커밍아웃한 남자 친구와 사귄다는 것은 단순히 일대일의 관계를 넘어서, 친구, 가족 등 서로의 일상이 섞이는 일대다 혹은 다대다의 관계로 넓힐 일종의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한없이 속물 같으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면서, 상대를 나한테만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마주하는 나날이 있다. 연애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참, 연애라는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일이라는 것이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연애에서의 1인분이라는 것,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긴 한걸까. 이렇게 부족한 내가 과연 연애라는 걸 하는게 맞긴 할까?
커밍아웃을 막 시작하던 20대 당시, 60살 즈음에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
1. 양가와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나를 숨기지 않고 공동체를 꾸리고 살아가기.
2.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도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나의 전문성과 임금을 인정받고 살아가기.
이제 한국 나이로 33살을 지나고 있는 지금, 과연 나는 그 꿈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걸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가족에 있어도, 일에 있어서도,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도,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서투른 것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기에, 1인분이라는 걸 하고 싶기만 했지. 대체 1인분이라는 것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딱, 1인분만 하고 싶어”라는 이번 칼럼의 제목은, 그래서 나를 위한 다짐의 시작이기도 하다. "1인분을 하고 싶다.”는 건, 혹은 “1인분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관계와 일에 있어서 커밍아웃한 나 자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도 잘 해내겠다는 다짐이니까. 명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크기를 알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위치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지닌 것에 대해 크게 욕심내지도 않고. 딱,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만큼,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해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앞으로도 참 서툴겠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존재하는 거짓과 진실의 무게를 온전히 나 스스로 감당해내고 싶다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나의 1인분일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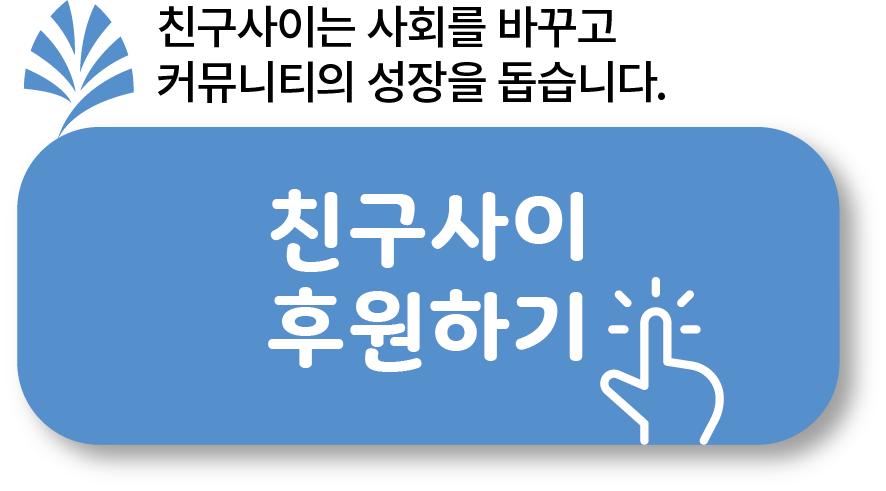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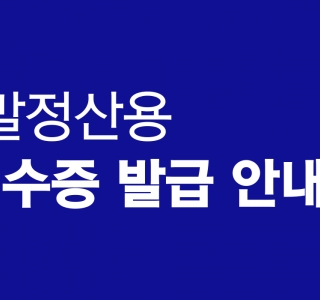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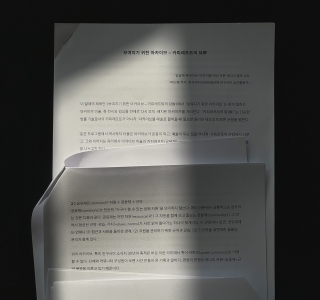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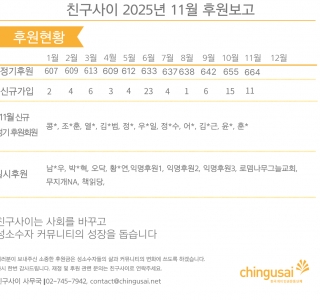










식당에서의 1인분은 내게 늘 부족하였으나 사회에서의 1인분은 내게 늘 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