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10월 |
|---|
[에세이] 내 인생의 퀴어영화 #5
: 리빙 엔드
|
* 수만 개의 삶과 사랑, 아픔과 감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매력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즐겨봅니다. 특히 영화에서 그려지는 주인공들의 삶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느낌은 배가 되죠. 영화로 만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한 달에 한 번씩, 페이스북에서 마주치는 친구사이 소식지에 실리는 [내 인생의 퀴어영화] 꼭지를 보면서 나도 여기에 투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명의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글들을 읽고 보면서 한때 퀴어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모니터로만 본 ‘퀴어영화’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가장 좋아했던 영화들이 달라지듯이 나도 인생의 퀴어영화들이 세월에 따라 달라졌다. 1990년대 초에는 ‘퀴어(Queer)’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지만 퀴어영화들이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기에 영화 잡지에서 간헐적으로 소개되는 ‘동성애’ 소재 영화들만 문서로 알고 있었다.
그 즈음, <크라잉 게임(The Crying Game, 1992년 닐 조단 감독)>과 <프리스트(Priest, 1994년 안토니아 버드 감독)>가 내게는 최고의 퀴어영화였다. 이유는 영화의 완성도나 감독의 명성에 있지는 않았다. <크라잉 게임>은 영화 개봉 이전에 모자이크 없이 남성의 성기노출이라는 자극적인 기사와 뉴스, 그리고 큰 극장에서 대규모의 관객들과 함께 본다는 설렘이 있었고, <프리스트>는 남성동성애자 신부의 이야기라는 영화 해설로 인하여 첫날 첫 회에 가서 보게 된 내 생애 최초의 퀴어영화이기에 오랫동안 내 기억속에 남아있는 퀴어영화였다.


그 사이에 한국영화로 <내일로 흐르는 강(Broken Branches, 1995년 박재호 감독)>이나 <마스카라(Mascara, 1994년 이훈 감독)> 등이 개봉했지만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시나리오나 영화적 완성도도 그닥 좋지 않았기에 내게도 특별한 기억을 주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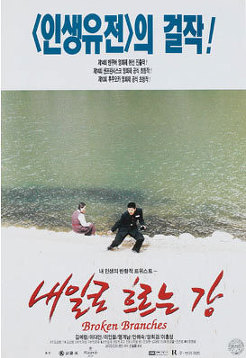

개인적인 사정으로 90년대 중반에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퀴어영화들을 보게 되었다. 아마도 그 당시가 내가 퀴어영화를 전투적으로 가장 많이 본 때가 아닐까 싶다. 그때 가장 좋았던 점은 퀴어영화를 많이 본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의 퀴어영화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오코게(Okoge, 1992년 다케히로 나카지마 감독)>와 ‘모래알처럼’의 한국어 제목이 더 익숙한 <해변의 신밧드(Like Grains Of Sand, 1995년 하시구치 료스케 감독)>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제작하기도 힘든 퀴어영화들이 소년의 성장영화로, 남성동성애자들의 삶을 밀도있게 그린 영화들로 제작되어졌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우연히 <리빙 엔드(The Living End, 1992년 그렉 애러키 감독)>를 보게 되었다. 물론 큰 화면의 사운드 좋은 극장은 아니었다. 지금도 퀴어영화가 배급되어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게 매우 힘든 상황이니 그 당시엔 오죽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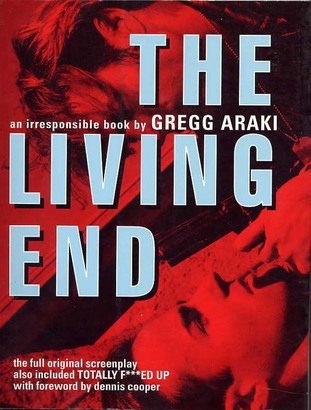
<리빙 엔드>를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 뭐지?’라는 느낌이 강했다. 그 전에 내가 보아온 퀴어영화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착했다.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고, 잠시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상대의 불합리한 요구도 참고 마는 순진한 주인공들이었다. 물론 <리빙 엔드>에서도 동성애자인 착한 주인공이 나온다. 하지만 마약도 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적은 돈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남성동성애자라니... 그들의 불안정한 여행길에 묘한 쾌감과 동질감을 느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퀴어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과연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던 나의 기분이 겹쳐진 것 아닐까? 그래서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
그 후로도 한 동안은 내 인생의 퀴어영화는 <리빙 엔드>였다. 지금도 때로는 다른 장소에서는 여전히 내 인생의 퀴어영화는 <리빙 엔드>일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에 개봉한 <호수의 이방인(Stranger By the Lake, 2013년 알랭 기로디 감독)>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독특했다. 살인자 애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파묻는 바람소리.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바람소리였다. <리빙 엔드>의 마지막도 바람소리로 끝을 맺는다. 어둠 속에서 사라져가는 살인자 애인을 찾는 심정과 광활한 황무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격정의 섹스를 한 후 들려오는 바람소리. 매우 다르게 다가온다.
![]()
친구사이 소모임 '친구모임' 운영자 / Timm
* 소식지에 관한 의견이나 글에 관한 피드백, 기타 문의 사항 등은 7942newsletter@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소식지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게시판에서 신청해주세요. ☞ 신청게시판 바로가기
*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친구사이의 활동을 후원해주세요. ![]() 후원참여 바로가기
후원참여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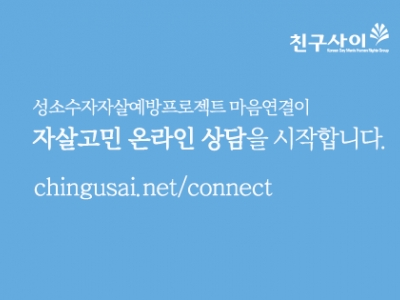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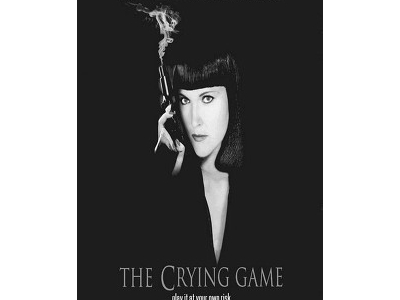

이욜
비쥬얼 폭발!!! 오왕~
박재경
요리대회라도 열거나 계절밥상 식으로 매달 보여줘도 좋겠당
루빈카
앗 ㅋㅋ 굴전...과 식탁보만 봐도... 누군 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 느낌 ㅋㅋㅋㅋ 수고하셨어요!
제이미(Jamie)
좋은 기획이네요ㅎㅎ 재밌게 읽었어요!
카아노
이럴땐 소식지하고 싶네여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