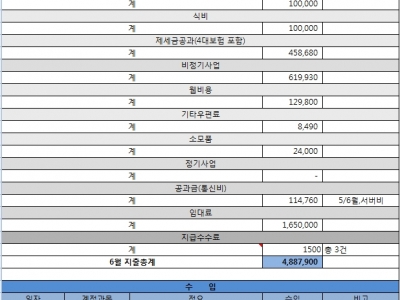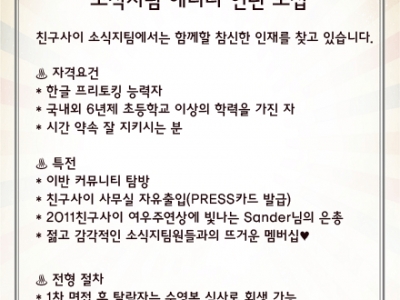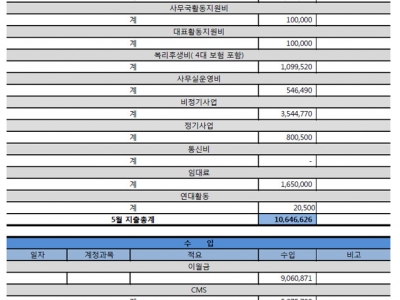| 기간 | 7월 |
|---|
영화감상-두 자매 시리즈! 4인 4색 감상평

1.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정준
영화는 후원시사회 때 그리고 지_보이스 연습을 마치고 단체관람으로 두 번을 보게 됐다. 첫 번째 봤을 때는 우리 게이들 이야기였고 또 지_보이스가 모티브가 됐기 때문에 실제 인물의 캐릭터들도 있었고 일반배우가 끼스런 연기를 맛깔스럽게 보여줘서 나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보조 출연한 실제 지_보이스 단원들 찾아보는 재미 등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유쾌하게 볼 수 있었다면 두 번째 봤을 때는 일반관객들 반응도 살피면서 실제로 우리 게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 보면서 보게 됐던 것 같다. 특히 커밍아웃을 두려워했던 민수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편견이나 차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격고 있는 많은 게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는 당당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을 그리면서 끝이 났다. 그런 세상이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라떼
친구사이에 나오기 전, 추운 겨울 극장에 나홀로 김조광수 감독의 단편 <친구사이?!>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났다. 친구들에게 보러가자는 말 한 마디 못 꺼내고, 게이친구 하나 없던 시절. 나는 그렇게 숨어 다니는 사람처럼 영화를 봤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똑같은 극장에서 이젠 형/언니라 부르는 광수언니와 영화를 보게 되었다. 내 인생은 그렇게 달라지고 있었다.
<두결한장>을 처음 본 것은 친구사이 후원시사회를 통해서다. 관객은 대부분이 게이들이었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실제 주인공과 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밝은 웃음만큼이나 훌쩍이며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대학친구들과 함께였다. 태어나 처음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대학생활을 넘어 일상 속에서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들과 퀴어영화를 보는 느낌은 특별했다. 친구들을 나를 통해 섭렵한(?) 수많은 문화, 키워드들을 알아듣고, 웃으며 영화를 즐겁게 보았다.
영화를 통해 나는 수많은 나의 조각들을 만났다. 커밍아웃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숨으려는 모습, 종로에서 친구들 만나 활짝 웃는 모습도. 숨으려는 민수의 모습과 자신을 긍정하는 석의 모습 모두에서 나는 나를 보았다.
예전의 나처럼 누군가는 <두결한장>을 숨어 다니는 이의 마음으로 봤을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숨지 않으리라 다짐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서 함께 하자고. ‘해피 엔딩’이 영화 속에만 남지 않도록!

2.두 개의 문
진석
이건 공포영화인지 다큐영화인지...보는 내내 불편하고 간담이 서늘했다.
용산참사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없었다. 철거민들에게도 경찰특공대원들에게도...
그들에게 철거민들은 그저 섬멸해야 할 대상이고 경찰특공대원들은 도구적인 소모품에 불과했던 걸까? 공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며 정부가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운다면 누구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할까?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만감이 교차하는 영화였다.
샌더
영화 <두 개의 문>을 두 번이나 보고 곰곰히, 여러번 생각해봤는데 달리 해야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아요. 사건이 있을 당시는 제 생일 새벽이었고 저는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용산 참사에서 아주 멀리에 있었거든요. 남일당 건물이 사라진 뒤에 그 터 앞에서 카드 회사의 독촉 전화를 받으며 괴로워한 일이 한 번 있을 뿐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산 참사는, 그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다른 사건들과 함께, 깊숙히 들여다보았다가는 마음만 어지러우니 결국은 외면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만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항상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둔하게 굴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살기에도 너무 바쁘니까요. 짜증이 나는 건, 이런 제 태도를 정부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깨달아 버린 거에요. 아무리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결국은 다들 제 삶에 치여 모른 채 해주는구나..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바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암요. 일일이 분노할 수가 없어요. 취업은 안 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선 매일매일 다양한 사회 문제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몇 사람이요? 일단 그게 저는 아니잖아요.
영화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읽히는 두 집단, 즉 용산 참사에서의 경찰특공대와 철거민들의 이야기에요. 이 영화를 선택할 정도의 관객이라면, 이 구조에서 가장 약자는 철거민이라는 것 쯤은 알겠죠. 게다가 이 남일당 건물 위의 망루 안에서 철거민들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합니다. 그들은 이 영화 안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할 힘이 없어요.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런 저의 답답함과는 상관없이, 영화는 경찰특공대와 철거민의 충돌 구조 안에서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조의 싸움 안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화는 이 싸움에는 피해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영화는 '약한 것'이 '강한 것'에 의해 '나쁜 것'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를 보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마냥 억울하고 슬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또 한가지 불편한 깨달음이 더 생깁니다. 바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안에서, 그들을 외면해 왔던 나도 가해자였다는 깨달음입니다. 저는 영화의 형식이나 영화의 문법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두 개의 문>이 주는 서스펜스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다큐멘터리가 그렇듯이, 이 영화 역시 그들과 함께 했고, 응원했고, '용산'을 떠올리면 눈물이 핑그르 도는, 진실에 근접한 분들이 봐야할 영화가 아니에요. 바로 저처럼 몸도 마음도 용산에서 멀어져, 잠시 눈 멀었던 사람들이 꼭 봐야할 영화죠. 그것도 한 번으론 모자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