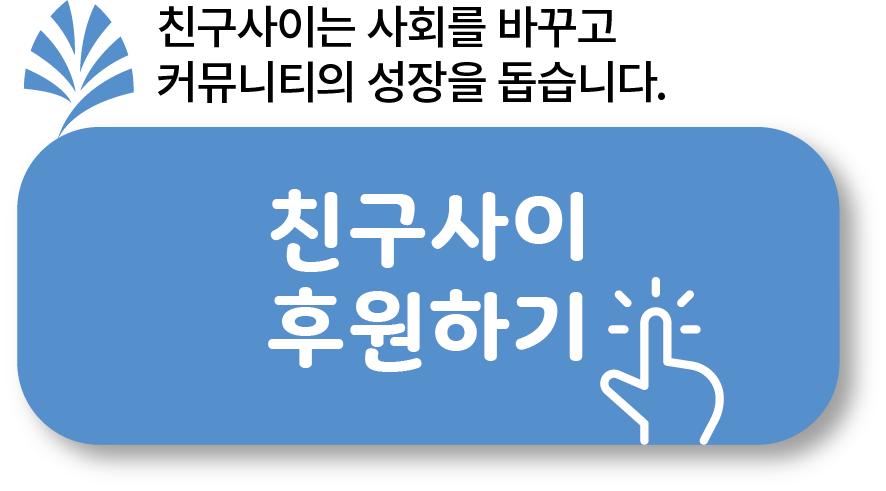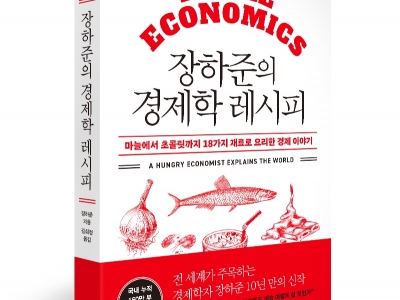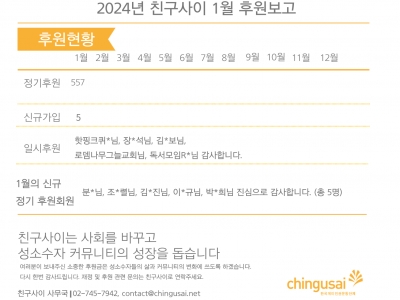| 기간 | 9월 |
|---|
[소모임] 책읽당 읽은티 #35
: 내 몸이 아파도 괜찮은 사회를 위해 -『아픈 몸, 더 아픈 차별』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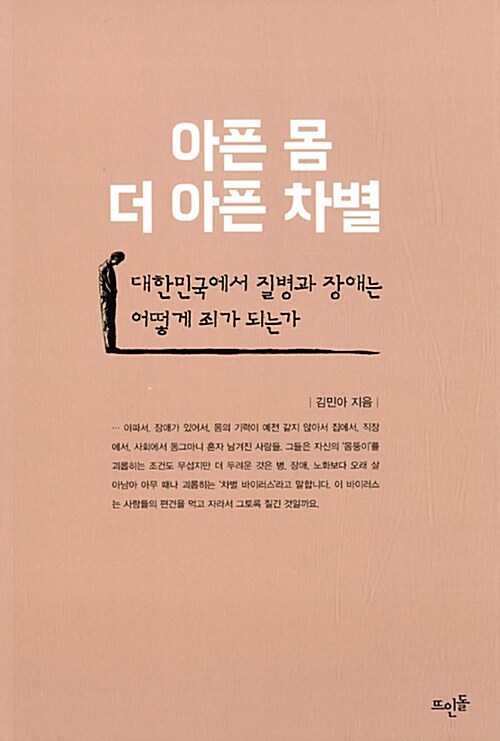
우리는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불과 3년 전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험했었다. 속수무책 퍼져가는 바이러스와 그에 따른 공포는 분노로 타올라 무주의한 행동을 한 감염자를 겨냥했다. 분노의 직격탄으로 폐허가 된 곳이 바로 ‘이태원’이었다. 2020년 5월 7일 지역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게 알려졌고, 언론은 헤드라인에 ‘게이클럽’을 부각하여 보도했다.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국민일보》, 2020. 5. 7)
‘이태원방문자=코로나감염자=동성애자’라는 공식과 함께 대대적인 검열이 시작되었다. 평일 내내 숨죽이며 살다가 주말 하루 클럽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춤을 추는 성소수자들의 모습이 SNS와 지상파 뉴스를 통해 전파되었다. 성소수자는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존재로 낙인되어 악에 받친 조롱, 멸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적 혐오와 아웃팅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은 이태원을 방문했던, 방문하지 않았던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성소수자에게 사회악 자리를 내어준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의 무지함에 코웃음이라도 치듯 2020년 5월 이후 3년 동안 무소불위 확산력으로 대한민국 국민 3,400만 명을 감염시켰다. 강조하지만 감염의 진짜 범인은 ‘코로나바이러스’였다. 하지만 당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는 사회적 성찰의 기회마저 잃은 채 지나갔다. 불과 2년 뒤 발생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도 ‘동성 간 성관계’에 따른 감염이라는 잘못된 사실이 유포되면서 반복적인 차별과 낙인이 등장했다. 오랜 시간 성소수자를 향해 전개된 오염의 메타포는 감염의 시대와 맞물리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였다.
아픔이 죄가 되는 사회
질병·노화·장애의 몸은 한국 사회에서 귀찮고, 쓸모없고, 급기야는 두려운 존재가 된다. 병에 대한 의학적 이해보다 공포에 사로잡혀 편견을 앞세우다 보니, 성 접촉·혈액으로 감염되는 병에 대해서도 옷깃만 스쳐도 감염되는 줄 알고 기겁한다. 노화란 시간의 유력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공평한데, 늙음이 예고된 우리는 모든 존재를 쓸모로 판단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을 폐기처분하는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신체와 기구가 덥석 잡히는 무례한 일이 비장애인의 ‘선의’라는 명분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일반우’, ‘비장애우’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장애우(友)’라는 명명은 사회에서 통용된다. 어째서 장애인은 ‘사람(人)’의 자리를 지우면서까지 친구가 요구되는 존재로 규정되어야 할까. 장애인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독립적 주체이자 존엄한 인격체라는 사실이 쉽게 지워진다.
한 집 건너 ‘아픈’ 사람이 있지만, 아픔은 집 밖을 넘어서지 못한다. 한국 사회는 장애와 질병을 대처하는데 사회적 체계를 구축하기보다 가족 구성원의 헌신과 희생으로 치부해버린다. 여기에 성역할이 관통되면서 돌봄은 아내/엄마의 몫으로 떠밀리기 일쑤다. 가정과 시설에 허약한 존재들을 욱여넣고 그들이 문밖을 나서는 순간 거친 말부터 쏟아낼 만반의 준비를 하는 세상이기에, 아프다는 것은 곧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의미한다. 아픈 몸보다 차별이 더 아픈 이유다.
‘이해’라는 함정을 넘어서는 ‘연결’
‘너의 아픔을 이해해’라는 말은 순간 위안이 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을 동반한다. 도대체 내가 지닌 질병과 차별에 대해 당신이 무엇인데 이해한다는 말인가. 타인에게서 ‘이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타인이 나를 잠식해 버릴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신체를 감싼다. 세상 모든 병명에 대해, 그리고 그 병을 지닌 존재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란 신을 제외하곤 없다.
우리의 승부는 이해라는 함정을 넘어설 때 가능하다. 저자의 말처럼 “질병은 내 몸에만 발현되는 증상”이 아니고,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징표로서 작동”한다. 그렇다면 질병·장애·노화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정교화하고, 여기서 작동되는 구조적 차별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해가 지닌 위계성과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내가 지닌 허약함과 타인이 겪었을 차별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박탈하고 성소수자에게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불허하는 데에는 닮아있는 차별과 폭력이 작동한다. 바로 시민권의 여부를 쥔 권력이 소수자에게 ‘시민’으로 대우받고 싶으면 숨죽이며 살던가, 아니면 벽장 안에 갇혀 나오지 말라는 겁박이다. ‘소수자를 보지 않을 권리’가 소수자가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짓눌러버린다. 그렇기에 차별받는 신체들이 서로를 엮어 연대의 그물망을 조직하는 일은 중요하다. 몸 안에 놓인 질병과 그로부터 발생한 차별을 사회로 꺼낸 존재들과 기꺼이 엮이며 ‘정치화’하는 일, 나는 그것이 아프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를 마감하는데 한 발을 내딛는 일이자, 정상성으로 뾰족하게 세워진 세상을 구부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
책읽당 당원 /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