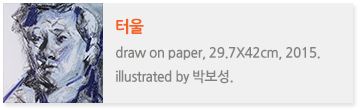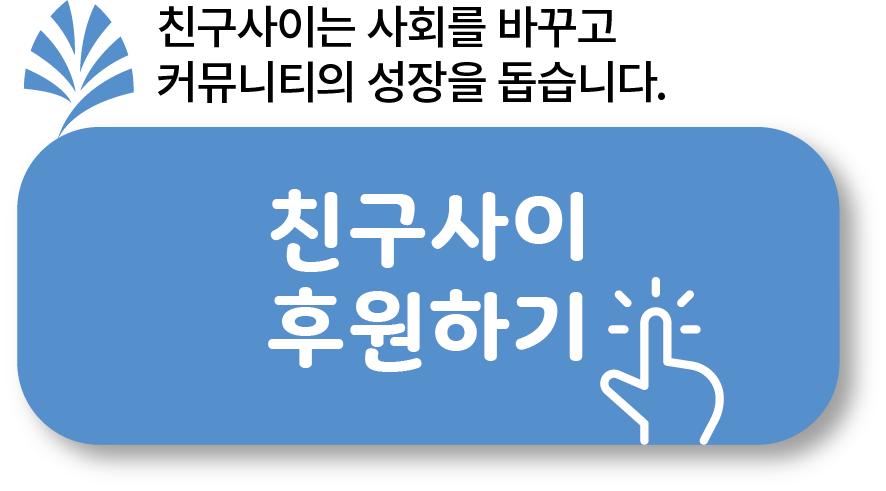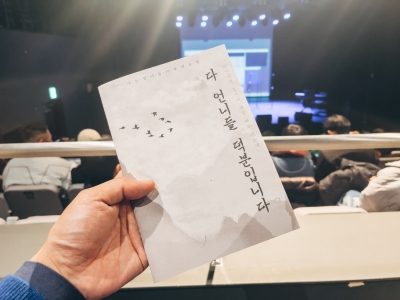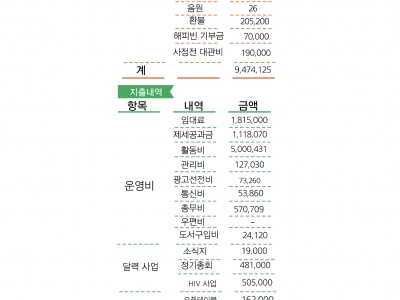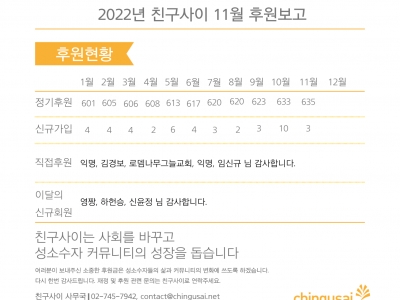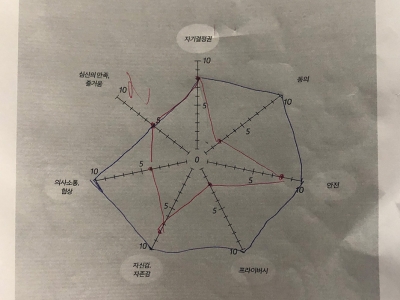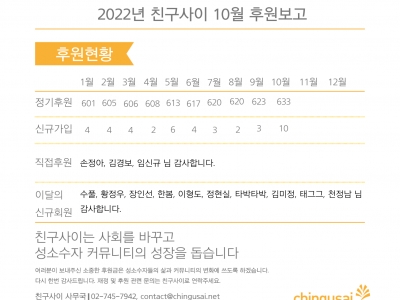| 기간 | 12월 |
|---|
[칼럼] 남들 사이의 터울 #3
: 팔지 않을 권리
스물 두살 때였다. 이반시티로 자바챗을 하다가, 어떤 스무살 짜리 애가 별안간 이메일로 자기 사진을 보내겠다고 했다. 보고 마음에 들면 만나자는 거였다. MSN도 버디버디도 아니고 이메일은 뭔 낀가 하며 지금은 없어진 프리챌 메일 주소를 건넸다. 잠시 후 받은 편지함에 발기된 자지와 벌거벗은 뒤태가 찍힌 사진이 도착했다. 준수한 몸매와 크기였던 것과 별개로 나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회사가 폐업했으니 걔의 알몸 사진도 DB와 더불어 영원히 사라졌을 거다. 다행한 일이다.
혼자 있을 때 누구나 한번쯤은 자기 알몸을 미친 척 찍어볼 것이고, 그중 적잖은 수는 알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찍기도 할 것이다. 어느날 쓸데없이 내 자위 영상을 찍고 싶단 생각이 들었고, 핸드폰을 잘 거치한 다음 자위를 시작했다. 몸 위로 후두둑 떨어진 정액을 닦고 녹화된 영상을 틀어보는데, 세상 추한 살덩이가 세상 보기 싫은 표정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포즈로 사지를 떨고 있었다. 여지껏 이걸 참고 나랑 섹스한 남자들이 송두리째 고마워질 지경이었다. 나는 황급히 그 괴이한 영상을 삭제했다. 3인칭으로 관찰된 내 몸은 대체로 남의 몸보다 낯설다.

트위터의 숱한 게이 섹계 영상들을 본다. 합의에 근거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전체공개 계정으로 시연하기를 기꺼이 선택한 듯한 삽입과 수용의 몸짓들은 대단히 섹시하고, 볼 때마다 아랫도리가 욱신거린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건 이태원 클럽에서 몇 번 보고 인사한 친구가 운영하는 커플 섹트 계정이다. 탑 바텀을 번갈아 하는 애인끼리의 섹스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도 원만히 유지되는 관계가 있음을 보면서 정말로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을 한다. 그건 분명히 이전에 떠돌던 몸캠 피싱 영상들과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다.
시스/헤테로 여성과 퀴어 간의 맥락이 크게 다른 의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르노다. 세상이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섹스와 금기시하고 혐오하는 섹스의 위계가 그러한 막대한 차이를 낳는다. 이성애자들이 포르노에서 코드화된 강간과 성적 착취를 발견할 때, 퀴어들은 대체로 거기서 내 섹슈얼리티가 이렇게 뻔히 존재해도 되는 것이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이성애자 여성과 퀴어의 포르노는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서로 다르다. 게이 섹트를 보고 달아오른 자지를 붙잡고 흔드는 행위가 이성애 섹트의 그것보다 덜 배덕적일 수 있는 까닭이 이와 같다.
하지만 둘 사이의 연결 지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트위터에서 몸과 얼굴 중 하나만 골라 까야지 둘다 까면 안된다는 묵계가 일러주듯, 한번 얼굴이 드러난 섹스 영상은 웹상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스스로 얼굴을 깐 섭들의 알몸과 돔의 지시에 기쁘게 따르는 몸짓들, 또는 한때 애인이었던 친구들이 애정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물빨하는 광경은, 적어도 촬영 당시에는 자발과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영상이 리트윗되고 다운로드 툴을 이용해 다른 플랫폼으로 숱하게 복제되는 그 전과정에서, 그 영상에 담긴 벗은 친구는 아무 것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종태원에서 소위 ‘팔리는’ 일, 즉 남자에게 환심을 사거나 섹스할 건수가 생기는 건 대체로 즐거운 일이다. 게이 게토 종태원의 성매매집결지적 기원과 ‘보갈/갈보’의 역사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귓등으로 들을 이성애자 페미니스트들이 있을 것관 별개로, 종태원에 오는 게이들은 분명 어떤 성적인 기대를 품은 채 그곳을 들르고, 그건 그 자체로 게이커뮤니티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기반이다. 하지만 파는 것이 선택일 수 있으려면, 어떤 순간에는 나를 팔지 않는 것이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 탈성매매의 관점이든 성노동자 인권의 관점이든, 자기를 파는 행위가 그 사람에 매인 낙인으로 돌려져서는 안되는 것과 더불어, 한번 자기를 판 사람에게는 자기를 팔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기란 의외로 쉽지 않다.
내가 보면서 자지를 흔든 섹트의 그 숱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아무쪼록 합의에 근거한 기쁜 섹스로 그들과 나를 즐겁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종태원과 다른 곳에서 자신을 전시하고 누군가가 나의 매력을 알아주고 한번쯤 괜찮은 남자가 내 속살을 탐해주길 바라는 게이들이, 내부로부터와 외부로부터의 큰 저항과 죄책감 없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기쁘게 즐기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시에 그들이 별안간 그것을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무런 걱정과 번민과 압력 없이 그것을 그만둘 수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세상의 섹슈얼리티에는 즐거움만 도사린 것은 아니다. 우선 종태원의 성적 활력이 유의미한 것 자체가 바로 그 바깥 세상에서 게이의 섹슈얼리티가 부당하게 억압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성적 활력이 그 나름의 명분을 갖고 실천되는 게이커뮤니티 안에서, HIV 감염인은 그 병이 성매개감염병이라는 이유로 커뮤니티 내 누구보다 강렬하게 차별받는다. 몇몇 게이들이 자작 포르노 감상차 이용하는 온리팬즈를, 이성애 사회는 국제적인 규모의 신종 온라인 성매매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이성애 사회의 N번방 성착취의 사례, 이성애 사회와 게이커뮤니티 양쪽 모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사례는 말할 것도 없다. 섹슈얼리티의 이름 아래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하고도 참담한 일들이 두루 발생한다.
그처럼 종태원 바깥에는 숱한 남들이 있고, 종태원 안에도 실은 다양한 남들이 있다. 그런 무시무시한 남들의 사례를 알아두는 것은, 행복해야 마땅할 내 섹슈얼리티 수행에 초를 치는 뭔가가 아니라, 마땅히 알고 그 위험을 피해 내 섹스를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지름길로 여겨짐이 타당하다. 그런 것들이 안중에 없는 섹스의 즐거움이란 손쉽게 또다른 사고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섹스를 온전히 즐겁지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모르고 눙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능히 알아야만 그것을 피하고 살 수 있다.
남과 나의 피해에 억눌려 섹스 자체를 금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피해를 딛고 좀더 온전한 형태로 내 섹스의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 전연 지지받지 못하는 성적 지향을 안고서도, 굳이 구태여 남자를 끌어안고 이것이구나 행복해하던 여느 게이의 경험처럼. 성소수자야말로 내 섹슈얼리티가 남처럼 낯선 경험을 한번쯤은 해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내 안의 시퍼런 남을 한번 극복해본 연후에는, 이 사회의 숱한 남들과 마주하고 그에 비추어 내 섹스의 행복을 거듭 지키고 바로잡는 일이 또한 필요해진다. 처음 보는 남이 낯선 것만큼은, 나와 남을 포함한 세상 사람 모두가 한 마음일 것이므로.
* 이성애와 퀴어 간 서로 다른 포르노그래피의 맥락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고했다.
아미아 스리니바산, 김수민 역, 「포르노를 말한다」, 『섹스할 권리』, 창비, 2022.
밀레나 포포바, 함현주 역, 『성적 동의 : 지금 강조해야 할 것』, 마티, 2020.
캐서린 A. 맥키넌, 신은철 역, 『포르노에 도전한다』, 개마고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