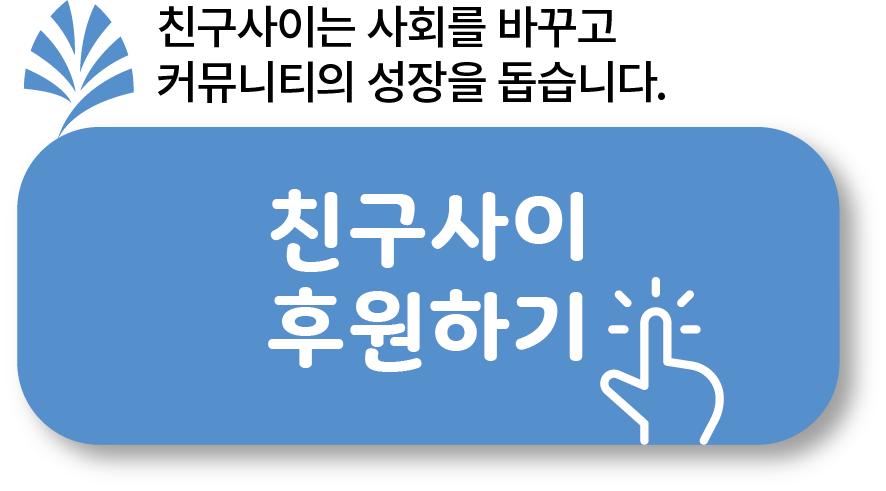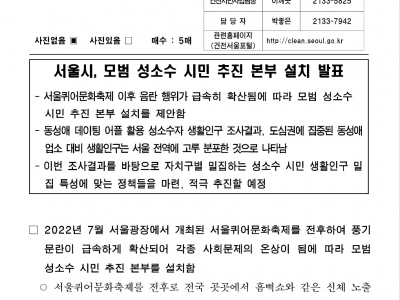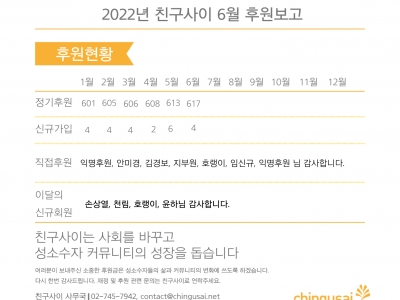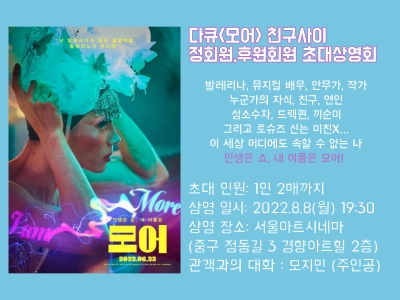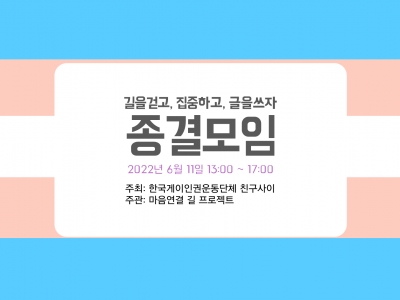| 기간 | 6월 |
|---|
[칼럼]
딱, 1인분만 하고 싶어 #2
: 잔소리의 귀환
“제니 너는 알아서 잘 하니까..
엄마랑 아빠가 이 말을 하기까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들어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잔소리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남이 사 어떻게 살던,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행복하면 되지’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잔소리는 건 어찌보면 참 귀하다.
굳이 본인의 에너지를 써가며, 타인의 삶과 1인 대 1인으로 엮이고 싶어하는 애정 어린 욕심이니까.

기숙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찾아온 17살 이후의 물리적인 독립. 그리고 대학 4년 간의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이라는 어설픈 경제적인 독립은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한동안 멀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크게 욕심부리지만 않으면 내 삶을 내가 꾸려가는 것에 그렇게 무리가 있진 않았거든. 그래서일까? 만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참, 자유롭게 살았다.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나 혼자 잘 살면 그걸로도 충분했으니까. 부모님에게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 자기 고민을 잘 말하지 않는 아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좀 예민한 아이로만 남아있으면, 서울에서 자취하는 내 생활에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기에 20대 초반의 나에겐 의지할만한 ‘가족’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홀로 서울에 올라와 접하는 사람이라고는 고작 대학 생활을 통한 동년배기 선후배들과 어플로 만난 누군지도 모를 게이들이 전부였으니까.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것 같다. 마치 너희가 처음부터 내 가족이라는 듯이 징그럽게 얽히고는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하게도.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혼자로의 삶을 만끽하던 26살의 추석, 얼결에 50대 중반의 부모님에게 갑작스러운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 굳이 왜 하필 그 날이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당시 나에게 브레이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유라는 것에 너무 취한 나머지, 내가 살고 싶은대로 사는게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기니까. 그 날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생각하는게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던 시기였다.

그래서일까. 난 분명 한밤 중에 어머니에게 먼저 커밍아웃을 했고, 그 당시 어머니는 “절대로 아버지에게는 말하지마라. 상처받으실거야”라고 말씀해주셨으며, 추석 겸 할아버지 산소에 방문하기 위해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니 아버지가 대뜸 “재훈아, 너는 유학을 가라. 내가 지원은 해주마”라고 말씀해주시던 모습까지 그 당시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분명 나에게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주 짧은 밤이었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그 밤이 그들에게 얼마나 길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다. 맏아들의 커밍아웃과 함께 찾아온 여러 가지 생각들. 본인들이 꿈꿨던 노년의 삶이 허무하게 무너지던 시간, 지방의 대형 교회 권사로서 지니고 있던 믿음과의 갈등, 혼자 서울에서 지내며 어떤 삶을 지내왔을까에 대한 연민, 어떻게 해야 저 놈이 앞으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그렇게 17살 이후 약 10년 만에 불편하지만 갑작스러운 부모님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다. 물론 서로를 이해하기까지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진 않더라고. 다행히도 지방과 서울이라는 물리적인 거리와 장학금이라는 어설픈 경제적 독립과 더불어, ‘내 아들이 기존에 내가 알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문화적 이질감은 부모님과 내가 서로를 조심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차수판 역할을 해주었다.

그 사이 부모님은 나라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기 위해 퀴어퍼레이드에 참석도 해보고, 종로에 있는 게이바도 함께 가보고는 하셨다. 교회 단톡방에서 전달돼오는 유튜브를 통해 짧게나마 배운 편견(혹은 단편적인) 덩어리 지식들을 “아들은 항문 섹스는 자주 하니?”, “아들은 그럼 언제 성전환 수술을 하는거니”와 같은 형태로 가감없이 질문해보고, 내가 친하다는 친구들을 지방으로 초대해 밥을 사주며 “너희들은 남자친구 있니?”라며 관심을 보이고는 하셨다.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역시 고민하셨다. 물론 아직까지 이루진 못했지만,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형태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에 상처받은 동생 간의 간극을 엮어주기 위해 노력하곤 하셨다. 드러내며 살고 싶어하는 나와,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상처받는 동생들 간의 중간 다리를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고는 하셨다.
그 사이,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들을 법한 잔소리라는 것이 없었다. 커밍아웃 이후, 부모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옮음을 기준으로 내 삶에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직접 부딪혀보고, 또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 투자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까. 부모님이 육십을 넘고, 나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어느 날,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 삶의 방식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과 함께, 가족이라는 관계 내에서 맏아들로서 지녀야 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 관계에서 나라는 사람이 지녔으면 하는 1인분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7살 이후, 16년 만에 찾아온 부모님의 잔소리는 부담스럽기보다는 참 반갑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