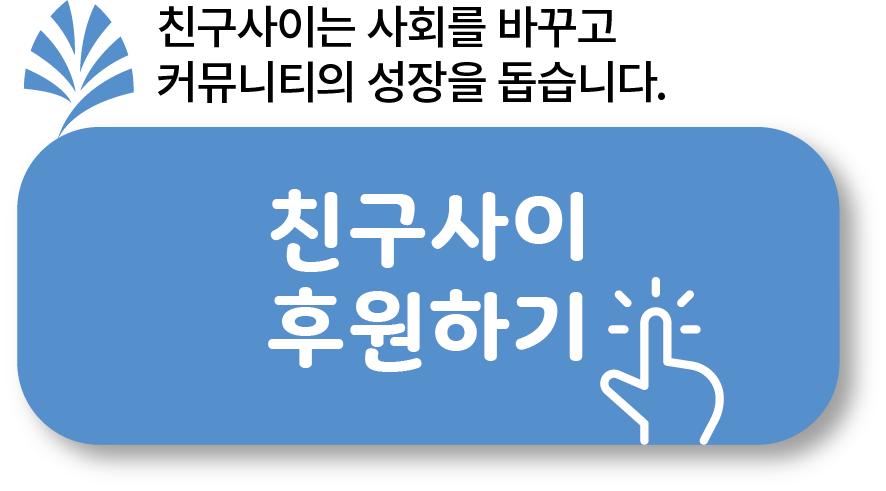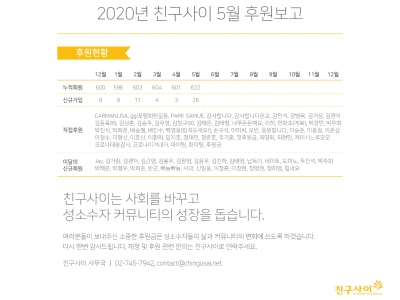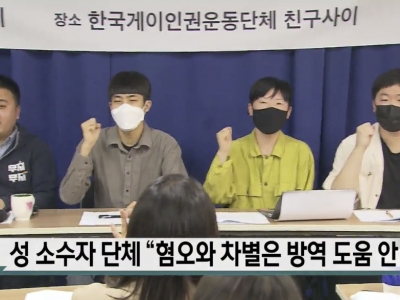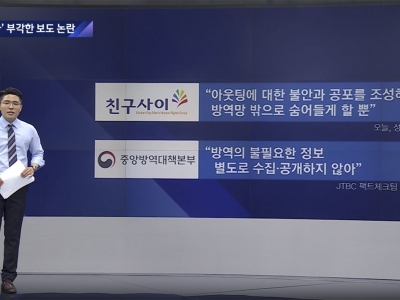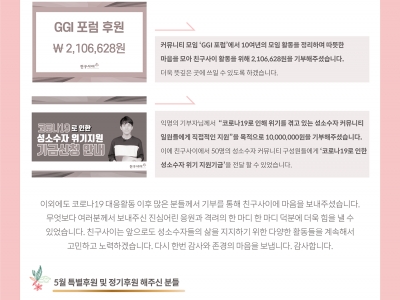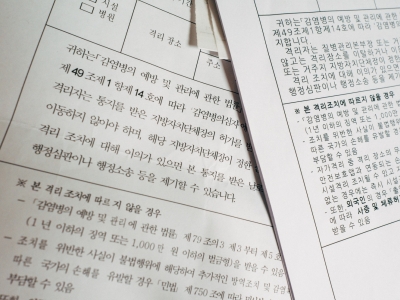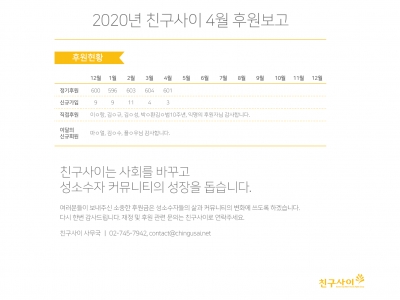| 기간 | 6월 |
|---|
[소모임] 책읽당 읽은티 #13 :
황주영, 안백린, <고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몇 년 전 내가 커밍아웃했던 고등학교 친구 A. 목사 아들이자 신학생이던 그는 뼛속까지 호모포비아였다. 그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글을 SNS에서 본 것은 바로 최근이다. ‘동성애자인 내 친구는 좀 이상하긴 해도 그렇게 추잡하고 못되먹은 녀석은 아닌데’ 생각했다고 한다. 고마워 죽겠다.
“요 쬐깐한 걸 생각하면 못 먹겠어…” 젊은 시절 여름마다 개고기를 먹고 핏물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즐기던 아버지도 봄이(11세, 말티즈)를 만나고 변했다. 우리가 좀 더 이타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일 테니까.

다음은 책에 대한 일문일답.
-
다들 책을 어떻게 읽었나.
플로우: 육식이 ‘동물들에게 비윤리적 행태를 가하는 중에 형성된 취향’이라는 말에 그렇구나, 싶었다. 나 역시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기!’를 외치고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향이 끊임없이 고기를 섭취하면서 형성된 것이라면 반대로 그건 바꿀 여지가 있다고 설득이 되기도 했다. 또 뭔가가 우월하고 무엇은 열등하다는 그런 계급논리 위에 산업이 등장하고 마케팅이 등장하는 하나의 전반적 시스템이 그려져서 ‘그런 맥락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점을 감각적으로 잘 써서 좋았다.
소피아: 보통 비거니즘이나 채식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장이라든가 맥락이 불편했다. 육식하는 사람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그런데 이 책은 여러 상황 속에서 채식·육식이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있어서 좋게 봤다. 비건을 해야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를 떠나서 읽을 수 있었다.
신민: 책을 읽기 바로 전날 치킨을 시켜먹었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는 동안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불편한만큼 또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동물이 음식으로 오는 과정에 대해 고려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작가가 ‘동물권에 대해 생각해봅시다’라고 말할 때 설득이 됐던 것 같다. 그렇다고 갑자기 비건을 하진 않겠지만 살아가면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다.
채식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다.
하진: 채식은 돈이 많이 든다. 채식을 해보려고 모임에도 나간 적이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채식 식당이 너무 비싸서 갈 엄두가 잘 안 났다. 거의 보통 전반적인 가격대가 야채 위주로 된 곳이 8~9천원, 콩고기를 곁들인 스타일이면 거의 만 원을 넘어간다. 혼자 해보려고 하면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없어서 힘들었다.
제이: 채식,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걱정된다. 누군가는 매운 것을 먹지 않고 누군가는 해산물을 가리듯이 그런 취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든다. 교환학생 때 만난 친구 중 무슬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할랄식당에 가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 결국 그 친구와 어울리지 않으려는 친구들도 생겼다. 소셜 액티비티와 채식은 양립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석: 저는 작년 여름부터 채식을 하고 있다. 다만 엄격하게 채식을 하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덩어리고기는 안먹고 계란/유제품/해산물은 먹는 페스코 정도에 해당한다. 사실 채식을 시작한 건 동물권이 계기가 아니고 환경과 육식이 긴밀하게 연결돼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단지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주제들, 환경오염이나 노동자, 여성, 등으로도 엮어낼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비거니즘이라고 생각한다.
작가가 쓴 ‘종차별주의’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본다면.
을기: 인간이 자연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은 굉장히 근대의 일이다. 당장 숲에만 들어가도 온갖 해충이 인간을 물어뜯는다. 자연에 있어서는 윤리와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히는 관계임을 인정해야 할 거다. 자연이나 동물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 책에서 말하는 ‘종차별주의’ 아니려나.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다. 윤리적인 먹기? 윤리적인 수면이나 윤리적인 섹스가 없듯 윤리적인 먹기라는 개념도 없다.
하진: 섹스는 둘이 뭘 하든 셋이 뭘 하든 합의만 된다면 비윤리/윤리와 상관없다고 생각. 근데 먹기 전에 우리가 그 개체에게 합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윤리적인 먹기라는 것은 저는 가능하고 종차별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개체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흑인이 열등종이던 시절이 있으니까. 사회가 발전될수록 더 많은 종들이 더 해방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신민: 평가나 판단 속에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그만큼 진화한 개체이기 때문에 종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누는 게 아닐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종차별적 발언일 수 있지만 어쩌면 ‘동물이 인간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더 진화했기 때문 아닌가. 섭리 아닐까.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는 구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을기: 공장제 사육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는데, 그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고기가 아니라 생명’ 이라기보다는 ‘고기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다른 생명을 끌어들여서 내 생명 유지에 쓰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그런 무거움이나 진중함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도축을 경험한 뒤 채식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심도 있게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플로우: 윤리적인 식사를 하고자 할 때 일상에 쫓기다보면 ‘당장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싶을 때가 있다. 단순한 방법 하나는 적게 먹고 양을 줄이는 것이다. 채식과 육식 사이의 이분법적인 선택도 좋지만 양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고기를 좀 줄여나가는 것.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안 먹는 것도 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건식을 좀 먹어보기도 하고. 입맛에 새로운 길을 들여보는 것도 새 먹거리를 찾아나서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멧비: 비둘기가 80년대쯤부터 각종 행사에서 방사되는 식으로 도시에서 살게 된 생물인데 비둘기는 원래 바위나 절벽 등에서 산다. 요새는 기피대상이 됐지만 그들이 더러워지고 싶어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환경이 더럽고 자연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은 너무 많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조경이나 도시 기획쪽에 이런 고민을 담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도시 자체를 자연의 유기체로 규정하고 조금 더 생태계처럼 비파괴적인 형태로 기획할 수도 있고. 순환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도 있고.
우석: 한 사람이 어떤 철학이나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다양한 연대와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다 떠나서 채식은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채식을 하거나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 탓일수도 있고 종교의 문제일수도 있다.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식 위주의 현재 식단은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의제가 얼마나 다른 이슈들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엮이고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동물권, 비거니즘 등은 다른 다양한 주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책읽당 총재 / 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