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10월 |
|---|
[칼럼]
내 불필요한 경험들 #2
: 박권사님과 비밀의 방
돈 주고 산 내 오지범 빤스들. 모친 덕에, 바지 벗을 일 없을 때나 막 입는 빤스가 되었다. 새로 산 옷들 소독한다고 삶아버려서 망가진 게 처음은 아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고심해서 색별로 고른 내 빤스들이 무지개 나염 빤스로 하나 된 모습을 보자니 한숨만 나왔다. 엄마는 어차피 속에 입는 옷, 남들한테 보여주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뭘, 하셨다. 그 앞에서 나는 보여줄 일이 없기는 왜 없냐는 말을 참고 또 참았다.
차라리 딱 더럽다고 이야기했으면, 나도 같이 그게 왜 더러운 거냐, 따지고 들었을 텐데. 박권사님이 근래에 하신 말씀+행동들은 꼭 지나고서 생각해보면 찝찝했다. 알아서 세탁기 잘 돌려 입는 빤스를 왜 삶냐고, 삶은 거 아니라고, 그럼 삶지도 않은 빤스가 왜 이 모양이 됐냐고, 실랑이를 벌이다 엄마는 안 넣던 걸 뭘 좀 넣고 돌렸더니, 하고 대충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가셨다. 며칠 뒤에는 방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네 방 화장실에서 소막냄새가 난다고 했다. 소막이 뭐냐고 묻다가 정작 요점은 다 놓쳐버렸다. 한참 뒤에야, 잘 쓰던 돼지우리간 같은 말 놔두고 갑자기 소막은 또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권사님은 스스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얼마나 지독한 역겨움을 느꼈는지를 설명하며, 그건 몇 년 전에 본, 기차에 좀비 나오는 영화보다도 더 했다고 이야기하셨다. 헛구역질까지 하시며 설명한 영화는 <부산행>이었는데, 새삼 박권사님의 낮은 항마력 수치를 실감했다. 역겨움에 대한 역치가 고작 한국형 좀비영화로 낮게 세팅된 박권사님이 <동성캉캉> 전시에서 사온 유성원씨의 책을 보고 혀를 내두른 것은 사실 이상할 것도 없던 거였다. 작년 연말, 계획에 없던, 엄마에게의 커밍아웃 후 암묵적 휴전협정은 이로서 모두 무효화되었다.

형아방에가서
침대밑에혈압기
좀가지고와봐!
내가좀이상함!
문자를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가슴이 철렁했다. 수축기 수치가 200을 넘었다. 아들이 게이라는 것을 알고 꼬박 2주 만에 엄마는 입을 열었다. 응급실이라도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핸드폰을 쥐고 안절부절하자, 일단 안정을 취하겠다고 너는 방에 돌아가 있으라고 하셨다. 나는 잠에 들까봐 불을 켜놓고 핸드폰을 쥐고 침대에 누웠다. 어릴 때, 그래도 엄마 여자면서 너무 남자들 편을 드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삼촌은 너네 형제가 여자였으면 너네 엄마는 벌써 월드와이드 페미니스트가 됐을 거라고 했다. 그 땐 그 말이 참 통찰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게이라고 해서 엄마가 성소수자부모모임 대표 같은 게 되는 일은 없었다. 나는 잠에 들었고, 그 날 이후 엄마는 미루고 미루던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다.
작년 겨울의 소동을 떠올리자, 우선 엄마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나는 최근 게이작가들의 책을 사 모았다. 시중에서 살 수 없던 유성원씨의 책은 내 수집욕을 자극했다. 그러나 내가 산 많은 다른 책들처럼, 책을 손에 넣고 나서는 전과 같은 흥미를 유지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조차도 사놓고 아직 찬찬히 읽지 않은 책이었다. 박권사님께서 내 방을 청소하다 굳이 그 책을 읽은 거였다. 사랑을 믿지 않고 찜방에서 남자들 좆을 빠는 얘기도 읽었을 것이다. 박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내 자식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다니, 하셨고, 나는, 난 그렇게 안 산다고 아무 말이나 뱉었다. 엄마는 그런 책은 버리라고, 버린 책을 누가 주워서 읽어서도 안 되니 찢어서 버리라고 했다. 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냥, 앞으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비장의 카드를 쓰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일요일 아침에 엄마와 사이좋게 교회에 나가 집사님들과 사람 좋은 인사를 하고, 엄마는 나와 성소수자부모모임에 나가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곧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외박이 잦아졌다. 시간적 여유는 더 없어졌다. 당연히 믿지 않는 신을 만나러가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다. 모텔에서 눈을 떠 애인은 출근을 하고, 나는 시간이 남아 스페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일반 친구 커플과 영상통화를 했다. 딱히 네가 게이가 아니었어도 어머니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을 거라고 했다.

엄마는 할 이야기가 있다고 식탁에 좀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대뜸, 이제 얘기 해봐, 그래서 너는 뭔데, 하고 물었다. 앞뒤 없는 질문에, 뭐가 뭐야, 하며 어물쩍 넘어가도 무리는 아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네 정체성이 무어냐고 재차 물으셨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누구냐고, 정체가 뭐냐고 묻다니. 엄마에게 나의 커밍아웃은 ‘내 아들이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게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사실이 아니었다. 누구나 그렇듯이, 오래 전부터 내게는 엄마가 몰라 온 내 모습이 있었을 뿐이다.
엄마가 내 방에서 발견한 것은 그 책뿐만이 아니었다. 햇수로 벌써 4년 전, 내가 군에 입대하고 엄마는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 내 방을 정리하셨다. 그러다 서랍에서 ‘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라는 문구가 찍힌 통장을 발견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날 후로 박권사님은 선한 내 아들이 그저 불쌍한 영혼들을 좀 도운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듬해에는 서울 프라이드에서 받아온 굿즈들을, 그 이듬해에는 읽지도 않으면서 책장에 꽂아 놓은 <성의 역사>나 <젠더 트러블>같은 책들을 차례로 발견하셨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나는, 적어도 엄마가 먼저 말씀을 꺼내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엄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이면서. 그러나 2년 좀 넘는 시간동안 내 방에서 대답도 없는 물건들에게 아들이 게이임을 이미 수차례 선고받았던 걸 생각하면, 용기고 뭐고 하는 게, 참 속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온전한 정신에 하신 말씀은 아니었겠지만, 네가 내 인생을 좀먹고 있었구나, 하셨던 박권사님 말씀처럼,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나는 조금씩 꺼뜨렸고, 엄마는 한계에 다다랐던 걸지도 모른다. 더 일찍 이야기해줬어야 됐다는 박권사님의 말씀은 속 편히 들을 말이 아니었다.

박권사님은, 옛말에 과부들의 욕구는 허벅지를 쥐어뜯을 정도라고 하던데, 20년이 넘게 요동침 없는 고요한 마음을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 은혜라고 했다. 하나님 은혜로 허튼 일 없이 두 아들에게 상처주지 않고 번듯하게 잘 키워낼 수 있었다고. 박권사님께서 혼전순결 같은 이야기를 꺼낼 때면 나와 형은 이조여인이냐며 놀리곤 했지만, 나와 형의 삶은 박권사님께서 평생에 걸쳐 일부러 외면해온 것에 큰 부분 빚지고 있다. 그런 박권사님에게 함께 사는 아들의 커밍아웃은, 한 지붕 아래서 매일 살아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마주하는 일이었다.
버리기도, 그렇다고 갖고 있기도 애매해진 빤스들도, 소막냄새 이야기도,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박권사님이 교회에서 샤워기 호스에 대한 께름칙한 비밀을 듣고 오시면, 그걸 해명하기 위해, 나는 그런류의 것들을 (즐겨) 하지 않는다고 해명해야 했고, 너와 형을 키울 때 형 방 침대 밑에서는 종종 젖은 휴지가 나오곤 했는데, 네 방에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난 또, 그건 그저 내가 뒤처리를 잘 했을 뿐이었다고 설명해야 했다. 박권사님이 교회에서 듣고 온 왜곡된 내 모습을 해명하다보면, 그는 그대로 또 서로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들이었다. 더러운 영과 사랑하는 아들을 구분하지 않고서는 못 배겼을 것이다.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함이 깃들어 있다. 부모와 자식이래도, 서로에겐 몰라도 되는 서로의 모습이 있다. 때로는 일부러 외면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이다. 내 일반 친구 말처럼, 박권사님과 나도 그 평범한 거리두기의 가르침을 여느 부모자식들처럼 배워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넘기고 싶다. 그런데도 가끔은 권사님과 게이아들에게라면 같은 가르침도 더 어려운 난도로 설계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조금 억울해진다. 이번 달에 박권사님이 내 방에서 발견한 것은 오라퀵.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해야 할까. 나는 또 얼마나 불쾌한 아들이 되어야 할까.
(사진_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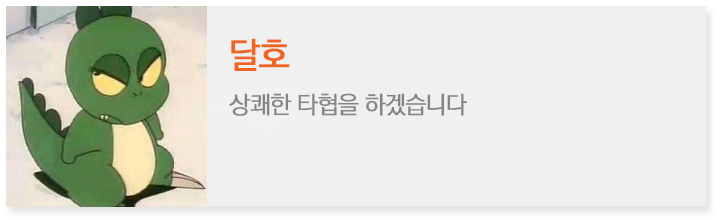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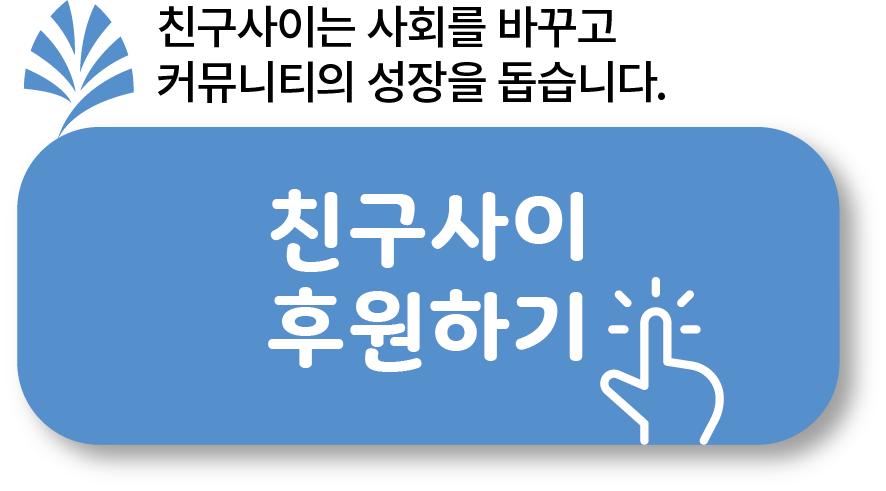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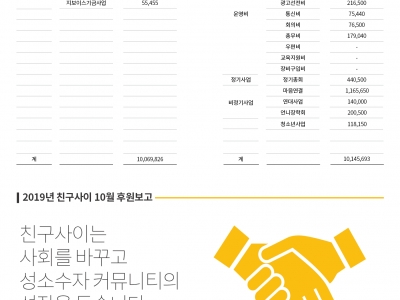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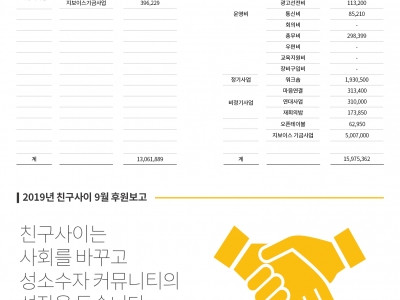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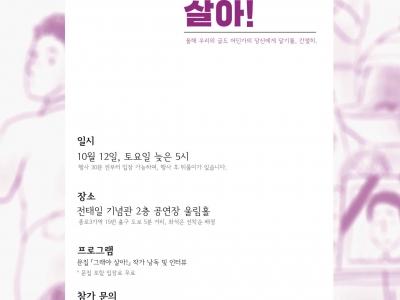




글 참 절절하고 좋네요.
퀴어들은 가족관계나 인간 그 자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너무 일찍부터 깨달아야 하는 게 참 가슴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