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5월 |
|---|
[에세이] 내 인생의 퀴어영화 #27 -
<쇼생크 탈출>, <굿바이 마이 프랜드>
|
* 수만 개의 삶과 사랑, 아픔과 감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매력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즐겨봅니다. 특히 영화에서 그려지는 주인공들의 삶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느낌은 배가 되죠. 영화로 만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 이 글에는 <쇼생크탈출>을 비롯, <불한당>, <베이비 드라이버>, <랜드 오브 마인>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1.
영화는 가장 대중적이고 손쉬운 취미인 만큼 나도 남부럽지 않게 영화를 소비한다. 해마다 수십 편의 영화를 망막 안쪽으로 흘려보낸다. 한 번씩 새까만 공간, 작은 좌석에 웅크려 얼마간 다른 세계를 보며 쉬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귀하게 낸 시간이니 영화는 철저히 내 흥취를 채워줄 만한 것을 고민하여 고른다. 다음은 일 년 남짓한 기간 동안, 내 기대를 얼마간 충족한 영화의 목록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 <랜드 오브 마인>, <런던 프라이드>, <베이비 드라이버> ,<분노>, <불한당>, <시인의 사랑>, <쓰리 빌보드>, <여교사>, <우리의 20세기>,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하트 스톤>.
사람들이 충실히 책을 읽던 시절에는, 그 사람의 책꽂이를 보면 그 사람됨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는 그 사람이 본 영화목록에서 보다 뚜렷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 영화들에는 내 욕망과 편벽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멋쩍고 부끄럽다. 몇몇은 퀴어영화이고 몇몇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은 영화들까지 내 욕망에 따라 ‘퀴어영화’로 보았다. 부처 눈에 부처가 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열심히 게이로서 보았다. 저 모든 영화들에는 하나같이 곤란한 처지의 청년(들)이 나오고 나는 이들을 양편-박해하는 자, 보호하는 자-에 투사하며 소비하였다. 나는 내가 본 좋은 퀴어영화가 무엇이었는지 답하라면 곤란함을 느낀다. 내게 좋은 영화는 모두 내게 ‘퀴어’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퀴어’하여야 내게 좋은 영화이다. 내 인생의 영화가 내 인생의 퀴어영화와 다르지 않다.
|
내 욕망을 건드린 퀴어한 좋은 영화들
영화 <불한당>, 설경구와 임시완보다 김희원씨가 분한 고병갑역이 흥미롭다. 설경구의 오랜 친구인 그는 설경구와 임시완의 관계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설경구와의 관계를 되돌리려다 설경구에게 죽는다. 그와 설경구 사이의 마지막 대화는 변심한 애인을 되돌리려는 절규와 같다.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 ‘박사’는 오래도록 ‘베이비’를 괴롭히며 그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해왔다. 그런데 박사는 위기에 놓인 베이비를 지키다 죽는다. 베이비에 대한 박사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 나는 박사의 죽음을 이해한다.
영화 <여교사>의 포스터,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맙소사,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영화 <랜드 오브 마인>, 2차 대전의 포로로 지뢰제가 작업에 동반된 독일 소년병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덴마크 장교의 이야기. 수십 명의 소년들을 두고 권력을 갖는다는 것. 장교는 폭군에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난다.
|
2.
그래서 내 인생의 퀴어영화는 <쇼생크 탈출>(1994)이 되겠다. 아무리 강인한 인상을 준 영화라 할지라도 올해 본 영화가 대뜸 인생 영화로 꼽히지는 않는다. 인생 영화는 오래도록 기억 깊이 침잠해 있다가 문득문득 복기되며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리라. 부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입소한 앤디와 그의 친구가 되는 레드의 이야기를 아주 어렸을 때 보았다. 그리고 그 몇몇 장면들이 내 삶에 깊이 새겨졌다.
옥상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앤디가 간수에게 절세요령을 가르쳐준 보답으로 동료들과 함께 맥주를 얻어먹는 장면. 죄수들이 긴 노동 끝에 부서지는 햇살을 받으며 실로 오랜만에 드는 맥주. 심하게 맛있겠다 싶었다. 난 꼬마였지만 그 장면에서 맥주 맛을 알아봤다. 좋은 영화는 경험하지 못한 바를 경험한 것처럼 내면화시킨다. 분명히 내 인생의 첫 맥주는 거기에 있다.
탈출 후 폭우를 온 몸으로 받아내며 포효하는 앤디, 포스터가 뜯기며 드러난 탈출로를 망연하게 들여다보는 소장 등 명장면이 많은 이 영화에서 나는 그 마지막 10분 남짓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레드가 반신반의하며 앤디가 남긴 말에 따라 앤디를 찾아가는 여행. 너무 아름다워서 이 부분만 따로 끊어내도 훌륭한 단편영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되도록 함께 기약 없는 수감생활을 의지한 앤디와 레드의 관계를 칭할 단어가 친구밖에 없다면 얼마나 빈한한가. 울타리 바깥의 어떤 부부가 이들보다 더 절실하게 서로의 삶을 보듬고 의지하겠는가. 아내의 죽음으로 감옥에 들어온 앤디가 새로운 삶의 ‘동반자’를 만나게 된 셈이다. 영화의 마지막, 해안가에서 요트를 손보는 앤디에게 마침내 다가서는 레드. 그 둘의 남은 삶 역시 함께 하지 않겠는가? 내게는 최고의 퀴어영화이다.

태평양 어느 해안에서 앤디를 찾은 레드. 영화에서 본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 중 가장 좋다.
기왕 이야기를 꺼냈으니 영화 한 편을 더하고 싶다. 역시 <쇼생크 탈출>만큼 오래된 영화 <굿바이 마이 프랜드>(1996, 원제: The cure)이다. 지금 보라 하면 넘길 영화이다. 병약한 아이가 나와 기어코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를 견디며 볼 자신이 없다. 아이 둘이 떠나는 모험이라 사건도 싱겁고 악역도 무르며 어리하다. 그래서 영화에도 때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당시의 나는 울라고 만든 영화는 성의껏 울면서 보는 관객으로 토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이 영화를 통해 나는 나를 알았다. 에릭 역의 브래드 렌프로에게 매료된 것이다.

에릭이 고무튜브의 노를 저으며 덱스터를 바라보고 있다. 앞서 한 말을 취소한다.
영화에서 본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 중 가장 좋다.
브래드 렌프로는 내가 처음 좋아한 배우다. 동서고금과 남녀노소를 통틀어 이전에 좋아한 배우는 없었다. 에릭은 충실히 덱스터를 지켜주어 좋았다. 용기도 있고 적당히 비겁하며 꼼수도 쓸 줄 알아 지금 봐도 캐릭터가 과히 낡지 않았다. 영화 중간에 한 동안 그가 상의를 탈의하고 나오는데 기가 막히도록 갖고 싶었다. 그 즈음 언뜻언뜻 들었던 게이로서의 자각 가운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꽤 뚜렷한 자각이다. 정말 좋은 영화는 욕망을 건드리는 것을 넘어 선도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중고 비디오테이프를 샀다. 파일도 있고 집에 비디오도 버린 때였지만 내가 처음 봤던 비디오테이프의 형태로 갖고 싶었다.

2000년대 초반, 신촌의 한 폐업하는 비디오가게에서 산 <굿바이 마이 프랜드>.
이것을 재생시킬 일이야 없겠지만, 내 욕망의 원형이 담긴 램프와 같기에 보관하고 있다.
난 줄곧 눈매가 가늘고 눈웃음이 예쁜 남자를 좋아했다는 것을 작년 친구사이의 한 친구와 대화하며 깨달았다. 그로부터 돌이켜보니 워낙 한결 같아 우스꽝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남자의 원형이 되는 출발점에 브래드 렌프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싱숭생숭하다. 나는 꾸준히 새로운 영화들을 볼 것이고, 새로운 배우들을 새길 것이다. 그럼에도 원점이 되는 인생 영화만큼은 쉬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브래드 렌프로는 나와 동갑이었다.
![]()
친구사이, 책읽당 회원 / 공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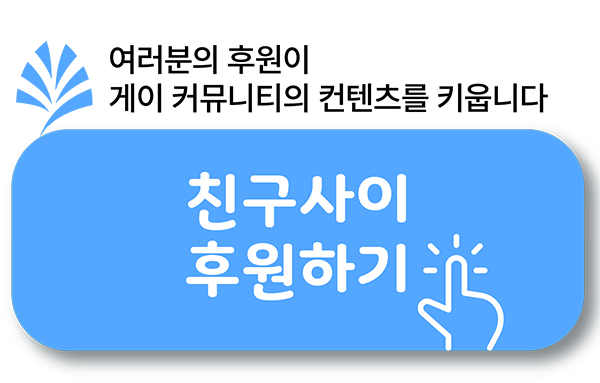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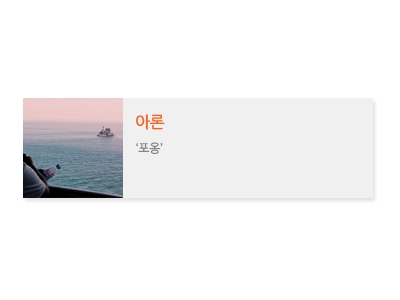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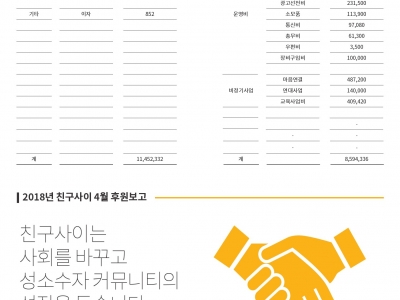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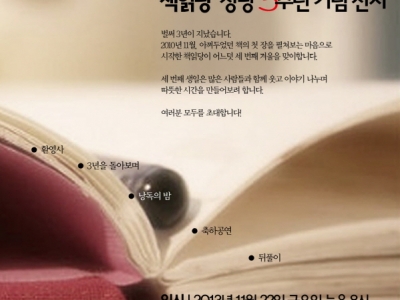




을기의 식성도 고백하고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