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8월 |
|---|
[86호][칼럼] 김대리는 티가나 #6
: 나는 게이니까
미워 죽~겠어!
'쁘아송'이 부러웠다. 마음껏 끼를 부리지만 드라마 속 어느 누구도 그가 게이냐고 묻지 않았다. 이렇게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이후로 어린 시절 장래희망은 무조건 패션/뷰티, 미디어, 의사, 변호사 중 하나였다. 미드/한드를 막론하고 미디어 속 게이들은 하나같이 잘 나가고, 화려하고, 합리적이며,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무리에서 일하는 소위 '게이들이 할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직업선택기준 가운데 나의 원픽은 Gay-Friendly였다.
이유는 단 하나 '나는 게이니까'
불행히도 이런 나의 오랜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은 결혼적령기에 들어선 나에게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며 '피아식별'을 해대고, 그런데도 야속하게 새어 나오는 끼는 '누나가 있어서' 혹은 '섬세해서'라는 변명으로 둘러대지만, 여전히 '게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게이임을 숨기는 법을 찾으려 하더니 '이건 게이 같아서 안 돼'라며 나라는 사람을 게이라는 틀 속에 가둬버렸다. 직장생활 4년 동안 주중엔 '게이'도 없고 '나'도 없었다. 그럴수록 어릴 적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만이 커졌다.
나 말고는 다들 잘살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수소문해보았지만, 종로 포차와 이태원 클럽 그 어디에서도 게이라서 행복하게 일하는 이를 보질 못했다. 심지어 나의 장래희망을 이룬 사람 중에도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게이도 여전히 혐오 속에서 살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쁘아송'은 한 번도 게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그저 사람들의 선의 위에 '깝치지 않고 주제에 맞게' 살고 있던 것이었다. 지금의 나도 그러하다. 그렇게 나의 유토피아는 유니콘처럼 상상의 나라로 날아가 버렸다, '쁘아송'만 남겨둔 채로 말이다.

'게이다움'이 뭔지 정의할 수 있을까? 천편일률적인 미디어 속 이미지와는 달리, 종로, 이태원, 시청광장에서 각각의 색채로 살고 있는 이들을 보았기에, '게이가 할 만한 직업', '게이가 잘 하는 분야', '게이라서 발달한 감각' 등 '게이'라는 꼬리표에 딸려온 이미지들은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오히려 게이라는 포장지에 갇혀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정작 중요한 나에 대한 고민은 이직적령기에 들어선 지금에서야 시작하게 되었고, 아직 찾아 헤매고 있다.
알에서 깨어나 맨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여기는 거위처럼 '쁘아송'은 나의 어미 새였다. 그는 나에게 게이가 무엇인지 처음 알려준 이었고 나를 살아 숨 쉬는 이반에게로 인도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쪽'으로서 겪는 공통점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성소수자로서의 삶은 사주팔자처럼 하늘의 뜻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젠 '쁘아송'을 놔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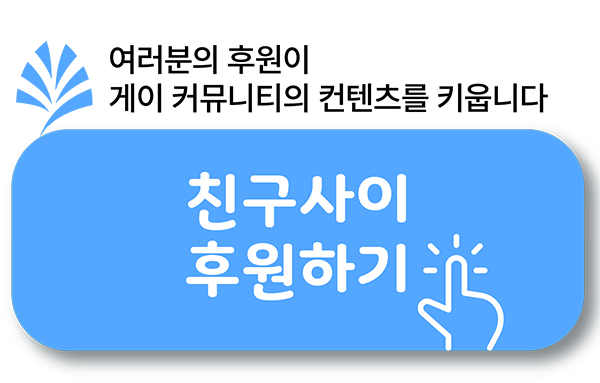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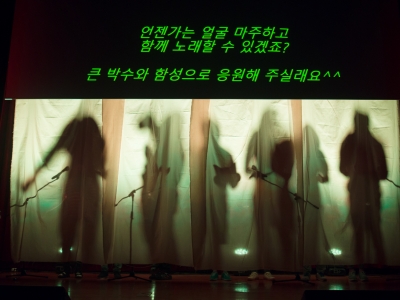










박재경
발빠른 소식지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