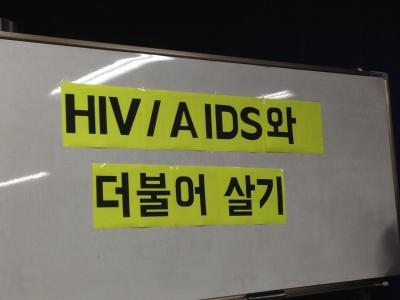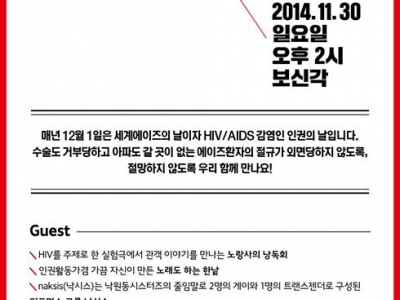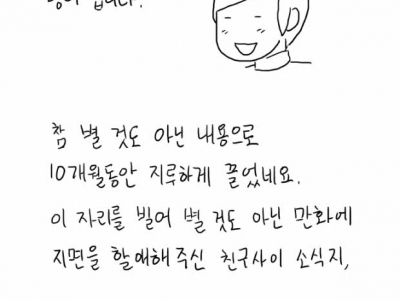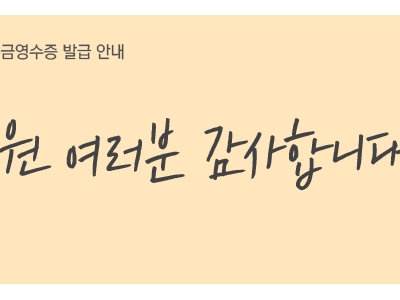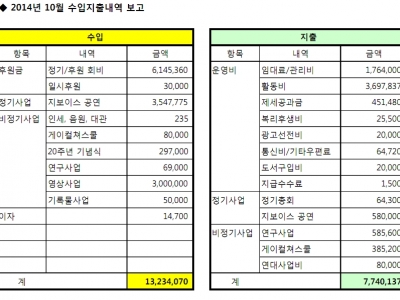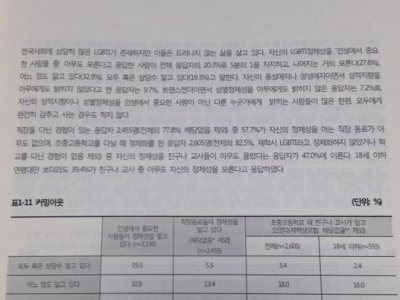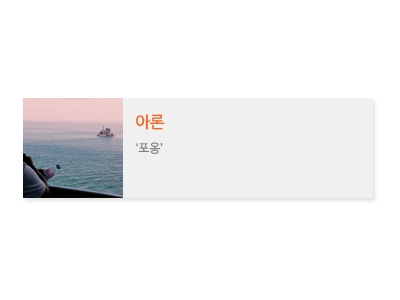| 기간 | 12월 |
|---|
<친구사이 20년史 톺아보기 #09>
성소수자 커뮤니티, 청소년을 품다
- 1998~2006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
집안 한 켠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낡은 컴퓨터. 뒤적여 보니 16년 전 관련 자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출사표인 양 썼던 첫 번째 기획안 제목이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를 열며’. 간만에 읽어 본다. 그때 20대 청춘이어서 그런지 혈기만 왕성하지 유치하기가 이판사판, 낯짝을 들 수 없다.
그럼에도, 얼굴 두껍게, 당시 무던히도 그 글을 회람시켰더랬다. 청소년 동성애는 커녕, 청소년에게서 ‘성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박탈하는 보수적인 사회다 보니, 청소년의 성에 관한 일반적 담론을 먼저 앞세운 기획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나 사회에서 가장 배제된 자의 목소리는 그 사회의 가장 일반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기억난다. 기획안을 처음 받아본 한국의 여러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당시의 놀람과 곤혹스러움. ‘청소년도 사랑하고 섹스할 수 있어요, 청소년 중엔 성소수자도 많아요, 얘네들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함께 이야기해요’.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고, 그 정도로 ‘청소년 동성애자’는 금기의 존재였다.
뿐더러, 청소년 성에 관한 금기는 당시 LGBT 커뮤니티 내에도 만연되어 있었다. 가뜩이나 인권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성인 동성애자들이 청소년을 유혹한다’는 통념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언제나 배제되기 일쑤였다. 설상가상으로 97년 김영삼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이란 희대의 보수적인 법을 만들어 청소년의 자율성을 최대한 억압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하고 있었다. 당연히 숨을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의 폐쇄 카페와 새벽의 으슥한 공원같이 보이지 않은 곳이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일 수밖에.
결국 98년 1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는 후원이나 연대체가 거의 없이, 그나마 청소년과의 상담 채널을 갖고 있던 ‘끼리끼리(지금의 레즈비언 상담소)’와의 공동 주최로 친구사이 사무실에서 열렸다. 홍보 수단과 자금이 전무하다 보니, 참가자 규모도 적었다. 10명 내외였다. 당시는 종로의 허름한 여관 건물 한켠이 친구사이 사무실이었는데, 그 비린내 나는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자긍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여름 날의 기억은 아직도 땀방울처럼 선연하다. 더불어 그때 참가했던 친구들 몰래 흘렸던 눈물도.

한 레즈비언 학생은 며칠 전 자살하려고 유리조각을 씹었는데, 학교가 열린다고 해서 왔다고 했다. 한 게이 학생은 지방 출신이었는데, 가족들한테 시달려 가출을 했다고 그랬다. 학교에 참여하고 싶어서 서울에 왔는데 묵을 곳이 없어서 공원 화장실에서 잔다고 그랬다.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일밖에 없었다.
학교가 열리기 몇 달 전, 우연히 알게 된 레즈비언 여고생 커플의 자살 사건. 어떻게 보면,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를 만들게 된 실제의 배경이었다.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받고 싶다는 쪽지를 남기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두 여고생의 서러움과 분노가 학교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이 시퍼런 회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1회 인권학교 이후, 그렇게 많은 도전이 시작되었다.
99년 뉴욕의 하비 밀크 학교를 방문하고 나서 학교의 맵을 다시 그렸고,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 청소년 인터넷 모임들, 그리고 각 대학교의 LGBT 동아리들과 연대체를 꾸려 외연을 확장했다. 돈이 필요해서 기부 파티도 열었다. 서울대 강의실에서 150여 명 안팎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운집하기도 했고, 야외로 여름 캠프를 떠나기도 했다. GLSEN(Gay, Lesbian & Straight Education Network)과 같은 교사 중심의 운동도 결합되면 좋겠지 싶어, 교대에 다니거나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을 인권학교의 실질적인 주체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때 만난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활발히 인권 관련한 활동을 하는) 한가람은 인권학교의 교장을 하면서 숙원사업이었던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를 마침내 발간하기도 했다.
그리고 10회가 되던 해, 인권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매년 각 단체 주체들을 묶어서 함께하는 동력의 고갈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지만, 이미 여러 단체들에서 청소년 사업들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단체는 청소년 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또 어느 단체는 자체적으로 청소년 인권캠프를 꾸리기도 했다. 후에 친구사이에선 ‘언니장학회’처럼 청소년 LGBT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했다.

어쩌면 인권학교 진화의 도착지는 하비 밀크 같은 자생적인 LGBT 교육 시스템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더 지속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인권학교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들이 여러 다양한 사업들로 응답되고 분화된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그리고 한 달 전인가, 모 청소년 상담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청소년 게이에 관한 내 영화 <야간비행>을 상영하면서 상담사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다. 이 단체는 국내에서 가장 큰 청소년 상담 단체이기도 하지만, 10년 전에 인권학교 때문에 내가 적잖이 괴롭혔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팀장이 부장이 되어 있었다. 가서 전국의 청소년 상담사들에게 내가 했던 이야기는 이렇다. “1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땐 인권학교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영화 감독으로 오게 됐네요. 저도 나이가 들었고, 한국 LGBT 커뮤니티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혹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상담이 오면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그냥 우리 쪽으로 전화를 넘기세요.”
알게 모르게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고, 더디지만 우리는 어떤 답들을 찾아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친구사이 20년史 톺아보기> 연재 순서
#01 성소수자 인권운동, 문을 열다 - 1994~1997 친구사이 발족 및 초기 활동
#02 당연한 권리를 위한 운동 - 2007~ 차별금지법 투쟁, 아이다호 캠페인
#03 자긍심의 절정을 보여주다 - 2000~ 퀴어문화축제
#05 이들이 있었기에 빛난 20년 - 역대 대표 인터뷰 및 설문조사
#06 챠밍한 게이 커뮤니티로 거듭나기 - 2003~ 챠밍스쿨, 게이컬쳐스쿨
#07 문화소모임, 느낌 아니까 - 친구사이 소모임 변천사
#08 쉽지 않은, 하지만 필요한 고백 - 2003~ 커밍아웃 인터뷰/가이드북, 영화 <종로의 기적>
![]()
친구사이 전 대표, 영화감독 / 이송희일
* 소식지에 관한 의견이나 글에 관한 피드백, 기타 문의 사항 등은
7942newsletter@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기획]<친구사이 20년史 톺아보기 #08> 쉽지 않은, 하지만 필요한 고백 - 2003~ 커밍아웃 인터뷰/가이드북, 영화 <종로의 기적>
2014-11-28 13:37
기간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