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8월 |
|---|
가위, 바위, 보! 철학강좌
- 책읽당 <샘이 나는 세미나> 후기

올해 7월 매주 토요일마다 <책읽당>은 철학강좌를 개최했다. 1주차는 근대철학입문-마키아 벨리, 홉스를 주제로 했고, 2주차는 사회계약론, 3주차는 공리주의, 그리고 마지막은 마르크스주의와 덕윤리, 성윤리에 관한 주제였다.
‘왜 철학강좌를 개최했냐’고? 답변은 간단하다. 떠들고 싶어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잘 떠들기 위해선 공통의 주제가 필요하고, 일상의 소재가 있어야 했다. 그게 바로 철학이었다. 아이러니하겠지만 철학은 본래 그런 학문이다. 일상적인 문제, 공통의 주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한 가지 질문에 더 답해야겠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근대철학'인가? ▲첫째, 내 전공이라서 강의하기가 좀 더 쉽고, ▲둘째, 지금의 사회제도와 사상이 르네상스 이후의 시대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선 근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도 물론이지만 사회도 역시 긴 역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멍석 깔아줬으니 신나게 떠들었다. 그래서 기운이 좀 떨어진 3주차 때는 잠시(?) 마이클 샌델에게 마이크(동영상 시청)를 넘겨주기도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마이클 샌델만큼 잘하진 못했어도, 그 교수만큼 신나게 철학 강좌를 진행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
나는 자유토론을 좋아한다. 치고 박고 싸우고, 난장토론과 같이 끊임없이 공수가 오가는 상황이 흥미롭다. 깨끗했던 상황이 점점 얼룩지고 난장이 되어 승패를 분간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들이 나의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흥분을 시킨다. 그 상황이 바로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1시간의 강의와 1시간의 토론은 그래서 기획됐다. 1시간의 강의와 그 강의에서 끄집어낸 주제가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의 입에서 잘근잘근 씹혀 새로운 ‘무엇’이 튀어나올 때의 쾌감. 원래 철학하는 맛은 씹는 재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철학은 마치 ‘가위, 바위, 보’ 게임과 같다. 찬·반 중에 승, 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는 게임. 바위는 가위를 이기지만 보에게는 진다. 하지만 보는 또 다시 가위에게 지는 게임. 쳇바퀴처럼 지고-이기고, 이기고-지는 게임이 계속되는 순환의 과정이 되풀이 된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열 받게 만드는 답답함이 있긴 하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렇지만 이번 강의에선 떠나는 중은 별로 없었다. 아무래도 <책읽당>은 ‘씹는 재미’를 아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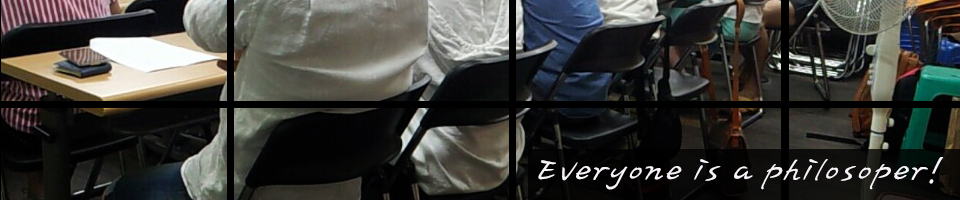
결론이 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말해봐야 뭐 하겠냐 만은 내가 바위를 내면 보를 내고, 보를 내면 가위를 내고, 가위를 내면 당연히 바위를 낼 테니. 그래도 지든 이기든 어쨌든 뭐라도 내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고 했으니, 혹시 내가 바위를 냈을 때 상대방이 멍청하게 가위를 낼지도 모른다. 역사도 어쩌면 이런 한 순간의 우연이나 뜻밖의 행운에서 비롯됐을지도 모른다. 역사의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뜻밖의 행운이 없지는 않았다.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나와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걸작들을 저술할 거라고는 몰랐을 테니. (알았다면 독배를 마시지 않고 좀 더 오래 살았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말한 적 없어!’라고 짜증이라도 내고 싶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래서 나는 내심 참석자들이 이기든 지든 하나씩은 가위든 바위든 보든 지니고 있길 바랐다. 행운을 바라는 요행자의 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으나, 무엇보다도 각자의 생각들이 철학에 힘입어 더 정교해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철학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정의가 있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철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자면 ‘간단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야겠다. 거칠기 이를 데 없는 답변이지만, ‘존재는 무엇인가?’, ‘실재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들은 매우 간결하다. 그 풀이과정이 복잡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두통 지끈거리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철학은 또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든다. 그 낯선 것들로 가득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 공허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점점 그 낯선 상태가 새로운 시안을 만들고, 생각을 정리하게 한다. 그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날 것들(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씹고(인식) 소화(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책읽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날 것을 씹고 소화하기를 바란다. 소화제(위로)에 의존하지 말고, 그 날 것을 씹어 넘기며 난장(亂場)인 사회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행운의 가능성을 높이길 바란다. Everyone is a philosopher.
ps.
- 강연 내내 이것저것 신경 쓰며 강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책읽당> 총재 라떼.
- 마지막 강좌 때 정품 ‘비타500’에 쪽지를 붙여 선물해준 Jamie! Thank you.
- 먼 거리에서 온 것도 고마운데, 던킨도넛을 사들고 와서 강좌 마지막 날을 기념해준 yammy에게도^^
- 3주차 때 강사보다 마이클 샌델이 더 말을 많이 했다며 강의를 날로 한다는 질타를 한 사람들. 그 3주차 하루만 그랬고, 생각해보면 그 날은 마이클 샌델보다 참석자들이 더 말이 많았다는 게 더 진실. 원래 그 날은 토론이 주목적이었음. ㅋ
- 그리고 강좌에 참석해준 사람들 고마워요. ^^
![]()
책읽당 회원 / 소피아
* 소식지에 관한 의견이나 글에 관한 피드백, 기타 문의 사항 등은
7942newsletter@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