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8월 |
|---|
[활동스케치 #1]
고통스럽더라도 메시랍게
: '모어' 상영회 후기
<모어> 상영회가 있던 8월 8일, 115년만의 기록적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다. 함께 가기로 했던 일행은 약속을 취소했다. 사실 나도 아주 잠깐 고민했지만 영화가 궁금하기도 했고, 출연진에 쓰인 존 카메론 미첼 때문에라도 가야할 것 같았다. 1997년 학생극장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화 <헤드윅>은 내게 문화충격이었고, 그 영화로 내 삶이 바뀌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다. 난 맨 앞 둘째 줄에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손끝까지 온 몸이 잔뜩 긴장된 채로 영화를 보아야 했다. 주인공 모어의 타임라인과 나의 타임라인이 너무나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달랐다. ‘뭐지? 뭐지?’ (아무래도 이 글은 너무나 당연히 매우 개인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놀랍게도 모어의 목소리가 처음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왜 그런지 그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랑 똑같단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그의 고향이 나와 같은 무안?!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나이도 나와 한 살 차이. 난 이때부터 이 영화는 그냥 내 이야기 같았다. (물론 당연히 모든 게 그냥 그저 우연이겠고, 모어의 그 벅찬 삶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지만.) 무안 사투리를 쓰던 모어의 엄마아빠가 나의 엄마아빠였고, 모어를 괴롭히거나 함께 했던 친구가 나의 친구였으며, 모어의 뺨을 때리던 무용 선배는 나의 연극 선배와 너무나 닮아있었다.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한 후 학교 옥상에 올라가 죽으려고 했던 나 혼자만의 기억, 엄마 누나들 옷 입는 걸 좋아하고, 텔레비전 속 발레리나를 보며 그렇게 되고 싶어했던 거, 소심한 편이었지만 소풍이나 수학여행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 그게 담다디였고, 김완선이었던 거, 교회에서 돌아오는 밤길에 옆돌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나를 ‘이상한 아이’라 기억하는 이제는 중년이 된 가시나들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 심지어 몇 해 전 존 카메론 미첼 내한 공연 때 모어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까지...
난 그렇게 좀 억지스러울 만큼 나의 기억을 그의 스크린 위에 우겨넣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계속 들었던 질문 하나가 있었다. ‘너무나 닮은 타임라인인데, 모어와 난 뭐가 달랐을까? 난 진실로 내 삶을 살고 있나?’

그러다 ‘1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모어의 말이 귀에 꽂혔다. 1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난 늘 부끄러워하고 조심하고 피해다녔다. 못 본 척, 모른 척, 아닌 척 그렇게 편안히(라고 착각한.)... 어쩌면 그게 모어와 나의 차이였을까?
불쑥, 무안의 집성촌 촌부락에서만 살다가 서울로 유학길에 오르던 나에게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사기만 안 치면 돼.
나: 응...
하며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때 난 그 말이 참 묘하게 모순된단 생각을 했었다.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면 때론 나를 속여야 하나?’ 엄마의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나는 자꾸 그 소리에 걸리고 찔렸다.
영화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며 세상과 현실을 부유하듯 떠다니는 제냐의 모습이 그려진다. 모어는 그런 제냐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고 응원하고 안아준다. 제냐의 모습에 내가 겹쳐졌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모어 덕에 제냐도 나도 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영화가 끝나고 GV가 있었지만 난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다. 그 GV마저 끝나고, 그냥 갈 수는 없어 극장 복도를 마냥 어슬렁거렸다. 그냥 가지 못하고 남은 이들의 마음을 알아준 친구사이 만루님이 포토타임을 주선해주었고, 그렇게 난 나의 차례에 드디어 그와 만났다. 그 순간에도 난 어버버버 거리다 ‘저 무안 몽탄이에요’라고 한 마디 겨우 뱉어냈다. 그 후의 말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모어가 존 카메론 미첼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았다. 하고 싶은 말이, 해야 할 말이, 나누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 아닐까? 그 마음을 알아챘을까? 모어는 연락하라며 나에게 번호를 주었다.
여전히 밖은 115년만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모어와 폭우에 갇혀 없는 뒷풀이라도 만들어 하고 싶었지만, 마음과는 달리 몸은 모어를 뒤로 하고 집을 향해 폭우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 순간 모어라면 폭우에 함께 갇히자고 그랬을까?
영화를 본 다음날 목이 간질거리더니 바로 다음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는 계속 피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국은 걸리는 거구나 싶었다. 피해도 피해도 결국엔. 친구사이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너무 심각해질 필요는 없는 걸 수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걸 수도.
폭우 말고 코로나에 갇혀 모어와 톡을 주고받았다. 서로 나이를 까고, ‘미로’라고 부르면 된다고, 당신이 쓴 책 읽고 있다고, 개고생 하염없는 삶을 살아온 쉽게 말하기 힘든 얘기들 들려줘서 고맙다고, 고통스럽더라도 메시랍게(맵시있게, 엣지있게, 우아하게) 잘 살아보자고, 당신 때문에 조금은 용기가 날 것도 같다고... 감사감사♡♡ 꺄루루룩 엉엉엉 꺄아악~~거렸다.

어쩌면 올해 안에 무안에서도 <모어> 상영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모어가 톡으로 얘기해주었다. 무안에서 퀴어라니!!!! 그동안 난 왜 그런 일이 무안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모어의 고향마을 무안 운남에서 찍힌 장면들을 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모어와 제냐를 태운 아버지의 딸딸이(경운기)가 동네 아짐들이 일하는 밭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다. 아짐들이 손을 흔들었던(?) 것도 같다. 너무 비현실적인데 너무 현실인.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변화의 순간은 그렇게 불쑥 찾아오는 걸까?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순간이 어느 순간 훅 기적처럼 올지도 모른다. 나는 <모어>가 무안에서 상영회를 한다면 나의 엄마와 함께 보러가고 싶다고 모어에게 톡했다.
![]()
친구사이 회원 / 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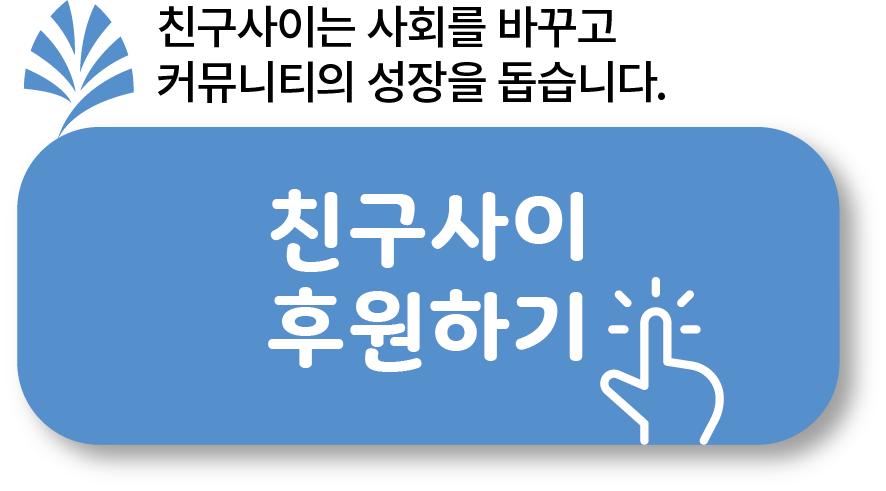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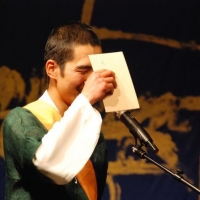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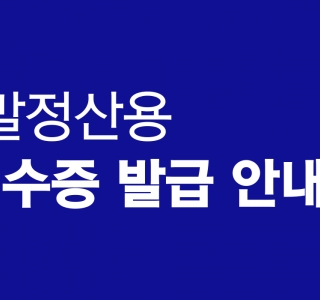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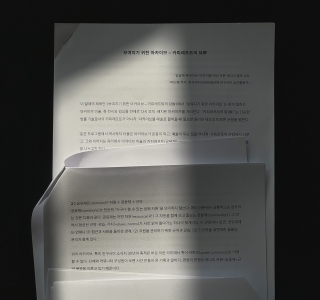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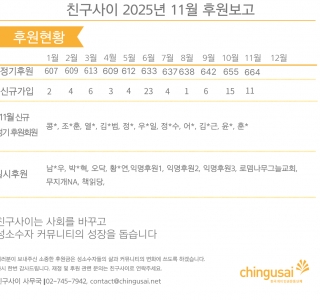










어맛 미로였구나
이제는 잘 회복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재밌는 발견을 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