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6월 |
|---|
[칼럼]
ㅈㄴㄸㅌㅈㅅ EP1 :
냉동인간
'친구랑 종각에 있는 주점을 갔는데...'
회사 근처 식당에서 후배는 둘만 아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퇴근 후에 친구들과 놀러 간 술집 얘기였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입사한 둘은 영업제한이 풀리고 나서야 퇴근 후 즐기는 술에 눈뜨게 되어, 일상으로 복귀한 직장인들이 평일 새벽까지 노는 모습을 보고 신기한 듯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옮긴 지 얼마 안 된 팀에서 갖게 된 점심자리, 자연스레 편한 안쪽 자리에는 과장인 나 혼자 앉고 불편한 복도 쪽에는 사원 둘이 앉아 있었다. 1미터도 채 되지 않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묘하게 섞이지 않는 대화 속에서 익숙한 벽이 느껴졌다.
왕년엔 나도 좀 치던 그 벽이었다. '주말에 뭐했냐',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냐'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이태원과 종로를 홍대, 강남으로 바꾸기를 수 십 번, 가상의 여자친구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게 되자, 나는 벽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시쳇말로 자발적인 아싸가 되기로 한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마음에 든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보호색을 띠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나에게 쏠렸던 관심은 자연스레, 후배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도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

새로운 팀에서 업무 외에도 익숙해져야 할 것들이 있었다. 바로 '상석'이었다. 어린 사람보다 더 편한 곳에 앉아야만 하는 나는 별반 다를 것 없는 '꼰대'였고, 이런 내게 익숙한 것에 반기를 드는 그들은 나와는 다른 또 하나의 '젊음'이었다. 꼰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참을 수 없는 건, 내게 이러한 전통을 물려준 선배의 배신이었다. 후배의 말에 귀 기울이며 솔선수범을 실천하고 심지어 육아휴직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그들은 Z세대와 함께 MZ세대로 묶이게 되는데 성공했다. 간간히 새어나오는 옛 모습도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시대의 변화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한 것이다.
'거기 나중에 대리님하고 가면 재밌겠다.'
그리고 나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토끼 같은 자식도, 불태울 젊음도 없는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그들 눈엔 나는 적응하지 못한 냉동인간이며, 해방은 찰나의 신기루에 그쳤다. 이제부터 냉동인간의 기록을 남겨보고자 한다.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ㅈㄴㄸㅌㅈ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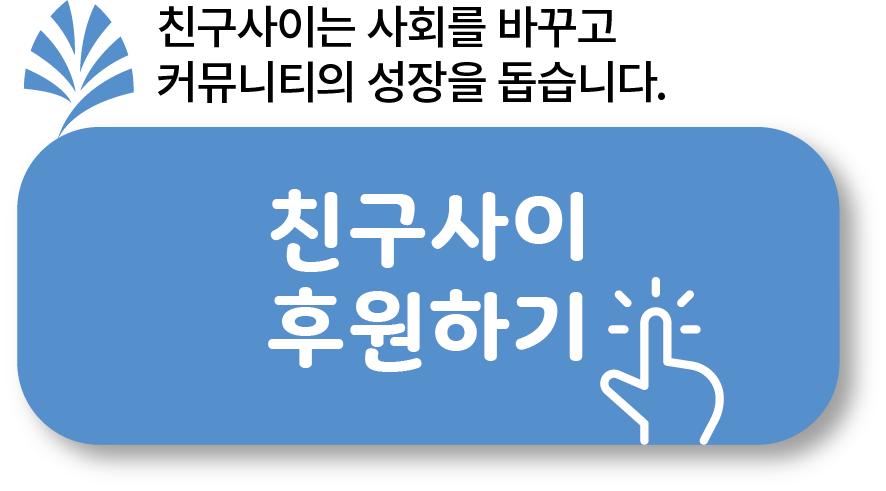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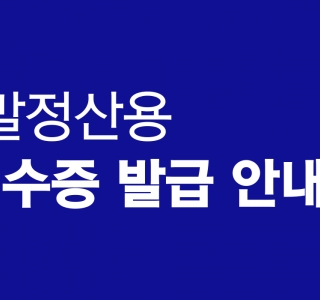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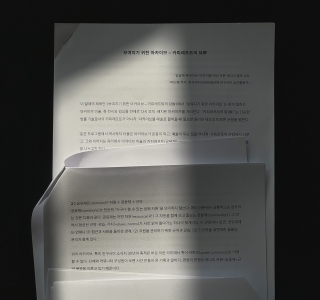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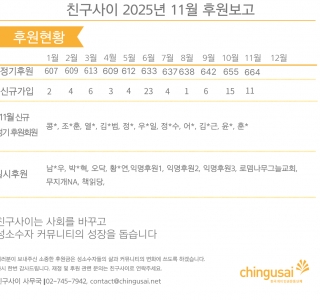










"그리고 나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토끼 같은 자식도, 불태울 젊음도 없는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묵직하게 와닿는 문장이네요.
그래도 어딘가에선 님도, 저도, 우리도 해동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