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12월 |
|---|
[칼럼] 은둔 사이의 터울 #10
: 이성애의 배신
1.
어떤 게이들은 왜 은둔이 될까.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이성애를 자연스레 경험한다. 교과서에는 철수와 영이가 나오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나온다.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고 어릴 때 동성애란 것도 있음을 가르치는 나라는 몇 없다. 그러니 자연히 이성애는 올바른 것이고, 장차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춘기 시절 음습한 영상과 장소 속에서 경험했을 내 성적 지향은 말 그대로 음습한 것이고, 그것은 이성애가 밤비처럼 뛰어노는 아름다운 세상과는 이내 상관없는 것이 된다. 나는 이 의뭉스런 음습함보다는 저 밝은 세상에 머물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사랑하고 관계맺는 저 따뜻하고 자연스런 곳으로 향하고 싶다.
나는 드라마에서 자주 본 대로 예쁜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녀와 떨리는 손을 쥐고 마음 졸여가며 아껴둔 스킨십을 나눌 것이고, 방송에서 본 대로 이벤트와 선물을 나눌 것이다. 그런 몇 번의 연애 끝에 하얀 면사포를 쓴 아내와 결혼을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오손도손 지내며 내 얼굴을 똑 닮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매 아침 식탁엔 따뜻한 밥이 오르겠고, 내 아이는 썩 공부를 잘할 것이며, 그런 아이의 재롱을 즐거이 보아가며 화목한 가정을 꾸릴 것이다. 몇 번의 일탈도 있겠지만 나는 이내 안전한 삶의 궤적으로 돌아올 게고, 아내와 자식 사이에서 세상이 허락한 대로 노후를 누리며 복되이 늙어갈 것이다. 이 모든 예정된 미래를 두고 음습한 내 샅에서 피어오르는 나쁜 예감을 따라 내 인생을 망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성애자들 모두가 실제로 그런 장밋빛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저 장대한 생애사의 관문마다 주어진 교범에 맞게 역할을 다하는 일은 쉽지 않은 퀘스트이자 만만찮은 노동강도가 들어간다. 연애와 결혼과 집장만과 육아와 저축과 자녀교육과 노후를 막상 맞닥뜨렸을 때의 무게는, 으레 그렇게 되리라던 이성애의 교범보다 언제나 무겁다. 자연스럽다던 그 교범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늘 당사자가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창발의 실천 가운데 이성애를 포함한 인생은 자기 것이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힘은 그것들에 내 마음이 동한다는 것이다. 이성애는 주어진 제도이고 교범이지만, 거기에 동하는 이성애자의 마음은 전부 다른 색깔과 경로를 갖는다. 따라서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은 언제나 남들이 떠들던 것 바깥에 있다. 인생이 재밌고 탄실해지려면, 주어진 제도를 따르든 말든 그 마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꿈과 희망을 찾아 이성애 동산에 달려온 나는 망연해진다. 이성애자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게 이성애가 아니라면, 나는 여태 무얼 바라 이 길을 걸어온 것인가. 사회가 제공한 교범 이외의 것이 내 삶에 필요하다면, 그 구체를 만들 힘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별안간 나는 내 삶이 대자적으로 낯설어진다. 덧발라 살던 그 이성애의 껍데기에 심지어 내 마음조차 얹히지 못한다면, 원래 마땅히 사회에서 그러라던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성애의 세계에 살고 싶어 이성애를 좇아왔는데, 그 삶의 핵심이 이성애 제도가 아니라면, 그 교범을 따르는 것 외에 인생에서 몸소 챙겨야 할 게 이토록 많았던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성애 동산의 그 누구도 내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썩 내키지도 않았던 몇몇 경험과 관계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 내가 무얼 원해왔는지 새로 더듬어보지만, 그마저도 쉽지는 않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습관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새 무엇엔가 배신당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 사회는 인간에게 마땅히 가르쳐얄 것을 너무 안 가르쳐왔던 게 아닌가. 그런 것쯤 모른 채 살아도 괜찮다고, 나를 한때 안심시켰던 그 모든 것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2.
3.
사람은 제도가 아니다. 제도가 약속된 삶을 보장하고 그 약속이 곧 나였다면, "고독사"로 죽는 이성애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는 주어진 껍데기일 뿐, 사람은 그 안에서 내용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내용을 만들 땐 그 껍데기를 너무 믿지 않는 편이 좋다. 가령 남성이 보다 일반적인 인간으로 여겨지는 까닭에, 많은 남성들은 거꾸로 인간으로서 삶의 경륜을 더 성기게 쌓는다. 인간이 제도를 너무 믿으면 그렇게 된다. "고독사"로 죽은 저 7할의 남성들은, 인생이 망가져가는 시점에서조차 가부장제와 이성애 제도와 정상가족의 힘이 그래도 내 인생을 잘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이 글을 보는 은둔 게이들과, 그 은둔 게이들이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모범적인 이성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당신들이 고독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는 어쩌면 당신들이, 나같은 커밍아웃한 게이를 보고 한때 가졌을 생각인 지도 모르겠다.
* '은둔 사이의 터울' 연재를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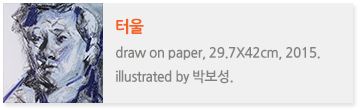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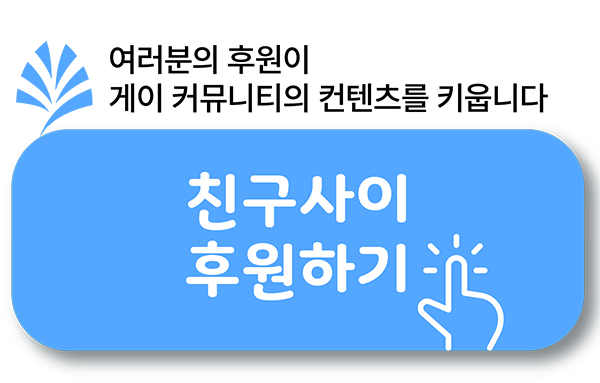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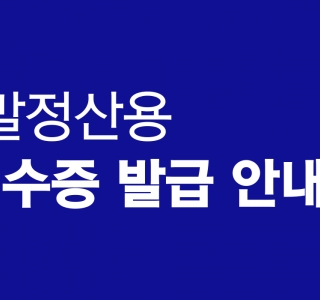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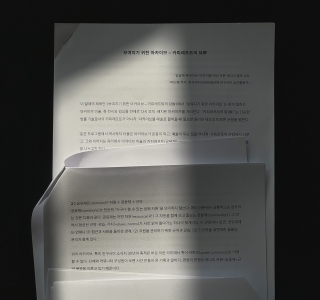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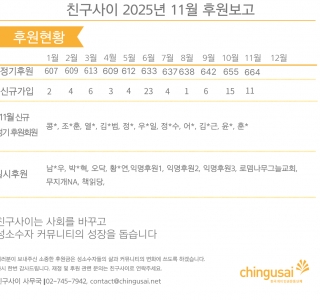










그동안 고생했다.
특히 이번 칼럼이 눈에 들어오네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다보면 만나는 지점,
제도보다 "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필요를 늘 느끼거든
그래야 내 길이 비록 새롭거나 돈을 벌게 해 주거나, 명예를 주지 않아도, 혁명적이지 않더라도,
달위를 최초로 걸은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