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8월 |
|---|
그 남자의 사생활 #10 – 즐거운 나의 집
“엄마, 사실 난 남자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날이 나에게도 오다니, 내 입으로 말하면서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7월의 어느 날, 나는 어느 카페에 마주앉아 엄마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었다.
시작은 누나와의 다툼이었다.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안타깝게도 내가 누나를 때리고 누나가 엄마한테 나를 아우팅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다. 그 날 엄마는 나더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누나는 나를 더러운 게이 취급하며 누나 때린 동생은 필요 없다고 심한 말들을 했다. (예전에 게이야동 보다가 들킨 적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그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도저히 집에서 가족들을 볼 자신이 없었다. 갑작스럽게 엄마한테 정체성을 들킨 나는 아무런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 집밖을 헤매다가 집에 들어가 캐리어 가득 짐을 쌌다.
집을 나오고 7월 내내 비가 왔다. 정확히 내가 집을 나오던 순간부터 비가 계속 왔다. 그리고 친구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나는 의미 없는 나날들을 보냈다. 새벽엔 천둥이 치고, 방구석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기타를 쳐도 눈물이 나오고, 아침에 씨리얼을 먹다가도 눈물이 났다. 집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 치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났다. 살면서 이렇게나 울어본 적이 있었을까. 집 밖에 나와 지내면서 가족들 아무도 날 찾지 않으니 정말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두 시간 전, 짐이 가득 찬 캐리어를 끌고 영등포역 광장에서 엄마를 기다렸다. 늦은 11시에 만나자던 엄마의 말, 덩그러니 엄마를 기다리는데 문득 유년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기억, 내가 다섯 살쯤 됐을 때였나, 그날 저녁 아빠랑 심하게 다툰 엄마는 새벽에 잠자던 나를 깨워 어디론가 향했다. 바로 엄마의 친정, 고향 광주였다. 새벽 기차를 타고 도착한 그 곳, 가로등 켜진 조용한 여름 밤, 마치 오늘 같았다. 붐비는 광장에서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엄마가 나를 보물, 혹은 인질처럼 그렇게 데리고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내 기억은 거기 까지다. 아빠랑 다투고 집을 나온 엄마와 다섯 살짜리 아이, 그 날 광장의 쓸쓸한 두 사람의 모습이 사진처럼 기억에 남았다. 엄마에게 나는 적어도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에 대한 알지 못할 감정들이 전등이 깜빡이듯 떠올랐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를 응원하는 사람

<영화 '친구사이'의 한 장면, 엄마는 커밍아웃한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기다리던 엄마가 나타났다. 언제나 그렇듯 해맑게 웃어주는 엄마, 이렇게 엄마의 미소가 따뜻했던 때, 나는 3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다. 독립심이 강해 언제나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나는 사실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어두운 모퉁이를 돌며 앞날이 깜깜하다고 느낄 때, 언뜻 내가 봤던 모든 희망과 믿음이 실은 환영이 아니었나 의심될 때, 그 날을 떠올리곤 했다.
뙤약볕의 8월, 입대를 하고 첫 면회 날, 나는 그 넓은 연병장에서 엄마를 찾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겠다던 엄마의 말, 내 귀로 직접 들었지만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었다. 수백 명의 군인들 사이에 서 멀리 바라본 인파속에는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는데, 나는 금방 우리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 날 혼자 내버려 두던 엄마가 날 보러 논산까지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나는 순간이었지만 멀리서 본 엄마의 모습이 진정 환영은 아니었을까 의심했고, 그리고 혹시 환영이 아니었다 해도 늘 곁에 없었던 엄마가 날 두고 가 버렸나 겁에 질렸다. 그리고 엄마는 큰 소리로 날 응원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내게 닿지 못했다. 벌써 크고 의젓한 우리 아들이 대견하고 예쁘다고 사진기를 들고 나를 기다리던 엄마.

그 날을 생각해. 그때 목이 터져라 너를 부르고 있던 엄마의 목소리를, 네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면, 신 혹은 우주 혹은 절대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겠지.
너는 아직 젊고 많은 날들이 남아 있단다. 그것을 믿어라.
거기에 스며 있는 천사들의 속삭임과 세상 모든 엄마 아빠의 응원 소리와 절대자의 따뜻한 시선을 잊지 말아라. 네가 달리고 있을 때에도 설사, 네가 멈추어 울고 서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공지영,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中
그렇게 수많은 기억을 스쳐 다시 만난 엄마와 그 날의 커밍아웃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지나갔다.
엄마를 만나기 전, 사실 난 머물던 집의 주인인 친구랑 다투고 지하철에 몸을 싣고 서울을 하염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언제까지나 그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었다. 그 전까지는 엄마한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문득 집이 그리워진 나는 용기를 내 엄마한테 전화한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걱정스런 첫마디,
“돈 떨어졌니?”
순간 내 귀엔 어떤 동요가 맴돌았다.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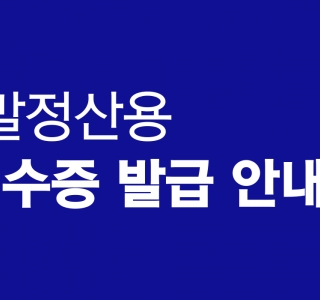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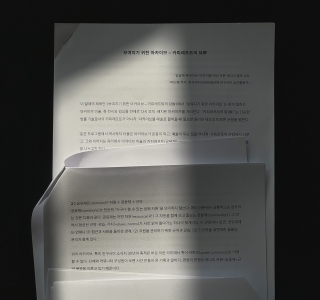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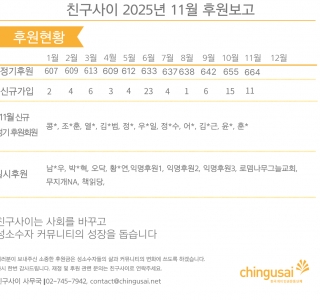










완전 기대되네